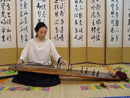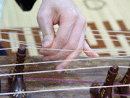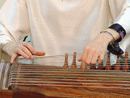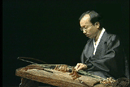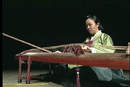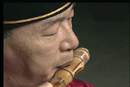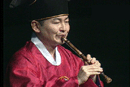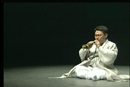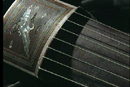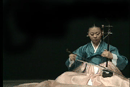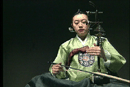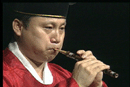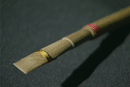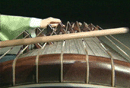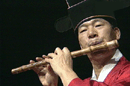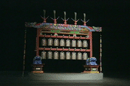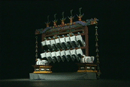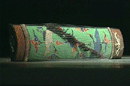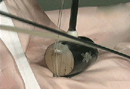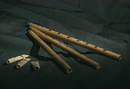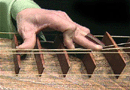예술지식백과
문화 관련 예술지식백과를 공유합니다
4교시 전통악기
- 수업개요
- 악기는 음악을 만들어내는 도구이다. 그러나 모든 악기가 모든 음악을 훌륭하게 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악기로 연주하는 라트라비아타나 피아노로 연주하는 진도아리랑을 생각해 보자. 평균율로 이루어지는 화음을 중시하는 서양 음악을 거문고나 가야금으로 악기의 특성을 살리며 잘 연주하기는 어렵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김새, 즉 농현이나 꺾는 소리 등 음의 변화를 즐기는 우리 음악을 고정된 음정만 내는 피아노로는 맛을 살려 연주할 수가 없다. 악기에 의해 음악이 만들어지지만, 반대로 음악에 의해 악기가 선택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과연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악기들이 있으며, 어떤 악기가 사랑받아 왔을까? 우리 전통 악기의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자. 또한 가야금은 우리나라 전통악기 중 대표적인 현악기로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으며 다양한 음악이 공존하고 있는 현대에도 여러 형태의 개량 가야금과 음악들로 인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야금의 역사와 변천 과정, 그리고 연주법 등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음악의 전반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단원에서는 전통 악기의 구분법과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단원에서는 오늘날 연주되고 있는 여러 종류의 가야금의 역사와 연주법의 차이를 알아 보자.
- 1. 개념단계- 전통악기 소개
- *강사: 최종민(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겸임교수) 악기는 그 악기를 만드는 재료나 쓰임새, 연주하는 음악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 악기의 연주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
- 가) 현악기 ① 발현악기 : 줄을 뜯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 ② 찰현악기 : 줄을 활로 그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 ③ 채로 치는 현악기 : 줄을 채로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 나) 관악기 ① 가로로 부는 악기 ② 세로로 부는 악기 다) 타악기 ① 음정이 있는 악기 ② 음정이 없는 악기
- 악기를 만드는데 쓰이는 중요한 재료에 따라 분류
- 가) 금부 ① 재료 : 쇠 ② 소재 : 편종, 특종, 양금, 방향, 운라, 자바라, 징, 꽹과리, 나발 나) 석부(石部) ① 재료 : 돌 ② 소재 : 편경, 특경 다) 사부(絲部) ① 재료 : 실 ② 소재 : 거문고, 가야금, 해금, 아쟁, 대쟁, 금, 슬, 향비파, 당비파, 월금, 공후 라) 죽부(竹部) ① 재료 : 대나무 ② 소재 : 피리, 대금, 중금, 소금, 단소, 퉁소, 지, 약, 적, 소 마) 포부(匏部) ① 재료 : 바가지 ② 소재 : 생황 바) 토부(土部) ① 재료 : 흙 ② 소재 : 훈, 부, 나각 사) 혁부(革部) ① 재료 : 가죽 ② 소재 : 장구, 좌고, 용고, 갈고, 절고, 진고, 교방고, 중, 건고, 삭고, 응고, 뇌고, 뇌도, 영고, 영도, 노고, 노도, 소고 아) 목부(木部) ① 재료 : 나무 ② 소재 : 박, 축, 어, 태평소
- 연주하는 음악에 따른 분류
- 가) 아부(雅部) ① 정의 : 아악(중국의 정악)에 편성되는 악기 ② 악기 : 훈, 지, 금, 슬, 약, 생, 특종, 특경, 편종, 편경, 건고, 삭고, 응고, 뇌고, 영고, 노고, 뇌고, 노도 등 나) 당부(唐部) ① 정의 : 당악(중국의 속악)에 편성되는 악기 ② 악기 : 방향, 박, 교방고, 월금, 해금, 아쟁, 당적, 당피리, 퉁소 등 다) 향부(鄕部) ① 정의 : 향악(우리 고유의 음악)에 편성되는 악기 ② 악기 : 가야금, 거문고, 향비파, 대금, 향피리 등
- 역사 기록으로 보는 악기의 유래
- 가. 거문고 진(晋)나라 사람이 칠현금(七絃琴)을 고구려에 보내왔는데, 고구려 사람들은 그것이 악기라는 것은 알았으나, 그 악기의 성음(聲音, 악기가 내는 소리)이나 연주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고구려 사람으로서 능히 그 성음을 식별하고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후한 상을 내리기로 하였다. 그 당시 제 2상으로 있던 왕산악이 그 본래의 모양은 그대로 두고 그 제도만을 고쳐 새 악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약 100여곡을 스스로 지어 연주했더니, 그 때 검은 학이 날아와 춤을 추었다. 그리하여 새로 만든 악기를 현학금(玄鶴琴)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후에는 다만 현금이라 불렀다. - 출처: 삼국사기 나. 대금 임오년 5월 초하루에 해관 파진찬 박숙청이 아뢰었다. “동해에 있는 작은 산 하나가 바다에 떠서 감은사를 향하여 왔다갔다 합니다.”라고 하니 왕이 이를 기이하게 생각하여 일관 김춘질에게 점을 치게 하였다. 일관이 말하기를 “대왕의 아버지(문무대왕)께서 지금 해룡이 되어서 삼한을 진호하시고 또한 김유신공도 삼십삼천의 한 아들이 되어 지금 내려와 대신이 되었습니다. 두 성인이 동덕하여 성을 지키는 보물을 내어 주려하니 만약 폐하께서 바닷가로 나가시게 되면 값으로 칠 수 없는 보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왕은 기뻐하며 그 달 7일에 이견대로 나가 그 산을 바라보고 사자를 보내어 살펴보게 하였다. 산세는 거북의 머리 형상이었다. 그 윗켠에 한간의 대나무가 있었는데, 낮에는 둘이 되었다가 밤에는 합해져서 하나가 되었다. 사자가 돌아와서 아뢰니 왕은 감은사에 나아가 머물렀다. 다음날 오시에 대나무가 합해져서 하나가 되니 천지가 진동하고 바람과 비가 일어나며 7일 동안이나 계속 캄캄하였다. 그 달 16일이 되어서야 바람이 자고 파도는 평온하여졌다. 왕이 배를 타고 바다에서 그 산으로 들어가니 용이 검은 옥대를 받들어서 왕에게 바쳤다. 왕이 묻기를 “이 산에 있는 대나무가 갈라지기도 하고 혹은 합해지기도 하는데 이는 무슨 까닭인가?”라고 하니, “비유를 하여 말을 하자면 한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두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는 이치와 같습니다. 이 대나무란 것은 합해진 연후라야만 소리가 나게 되므로 성왕께서는 소리로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왕께서 이 대나무를 취하여 악기를 만들어 불면 천하가 화평할 것입니다. 왕의 아버님과 유신공이 마음을 같이 하여 저로 하여금 값으로 칠 수 없는 보물을 왕께 바치게 한 것입니다.”라고 아뢰였다. 왕은 놀랍고 기쁘기 그지 없었다. 5색 비단과 금·옥을 용에게 주고 사자를 보내어 그 대나무를 베게 한 다음 바다에서 나오니 산과 용은 홀연히 사라지고 보이지 아니하였다. 왕이 돌아와 그 대나무로 악기를 만들어서 월성의 천존고에 보관하여 두었다. 이 악기를 불면 적병이 물러나고 병이 나으며, 가물 때에는 비가 오고 비가 올 때는 맑아지고 바람은 가라앉고 물결은 평온하였다. 그리하여 이 악기를 만파식적이라고 부르며 나라의 보물로 삼았다. - 출처: 삼국유사
- 2. 확인단계- 가야금 이야기
- * 강사: 이지영(용인대학교 국악과 교수)
- 가야금의 역사
- 삼국사기 악지에 가야의 가실왕이 가야금을 만들고 우륵이 그것을 가지고 신라로 망명하였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제작된 신라 시대의 토우나 항아리의 조각들에 가야금과 비슷한 악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역사는 그보다 오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일본에도 전해져 정창원에 ‘시라기고도(신라금)’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오고 있기도 하다.
- 가야금의 구조 - 각 부분의 명칭
- * 좌단 : 가야금의 상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여기에 손을 얹어두고 줄을 뜯는다. * 현침 : 가야금 상단에 덧대어 놓은 나무 조각으로 줄을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 학슬: 가야금 연주에 쓰이는 줄 중에서 남는 부분을 뭉쳐서 부들과 연결하는 부분 * 부들: 줄 뭉치를 가야금의 하단에 고정시키는 굵은 줄 * 양이두: 풍류 가야금의 특징적인 부분으로 양의 머리처럼 생겼다 하여 붙은 이름. 신라 시대의 토우에서도 이 모양을 찾아볼 수 있다. * 안족: 줄을 지탱해주며 음정을 조절한다.
- 풍류가야금(법금, 정악가야금)
- 가. 연주법 ① 앉는 자세 왼쪽 발을 오른쪽 다리 아래로 들어가도록 한 다음 오른쪽 다리를 약간 밖으로 내고, 양이두 부분을 앞쪽을 향해 30°각도로 비스듬히 놓고 좌단 부분이 오른 쪽 무릎 옆에 오도록 올려놓는다. ② 오른손 주법 * 뜯기: 검지손가락으로 줄을 당기듯이 뜯는다. * 밀기: 엄지손가락으로 줄을 반대쪽으로 밀어 소리를 낸다. * 튕기기: 검지손가락을 엄지손가락에 대었다가 튕기는 힘으로 줄을 쳐 소리를 낸다. ③ 왼손 주법 * 추성: 줄을 눌러 음정을 높인다. * 퇴성: 줄을 살짝 잡아당겨 음정을 낮춘다. * 전성: 줄을 순간적으로 눌렀다 놓아서 구르는 듯한 표현을 만든다. * 농현: 줄을 눌렀다 놓는 것을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음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 산조가야금
- 산조가야금은 지금부터 18세기 말엽, 민속음악을 연주하기 좋도록 개량한 것으로 풍류가야금보다 길이나 폭이 작고, 줄과 줄 사이에 간격을 약간 좁아서 빠르고 격렬한 음악을 연주하기에 편리하다. 정악가야금은 큰 오동나무를 악기모양으로 자른 다음 뒷면의 통속을 파내어 몸통을 만들어 쓰지만 산조가야금은 거문고와 마찬가지로 앞면은 오동나무로, 뒷면은 밤나무로 따로 만들어 붙여 공명통을 만든다. 가. 모양 나. 연주법 : 연주법은 풍류가야금과 큰 차이는 없으나 줄의 폭이 좁아 빠른 손놀림이 가능하고, 농현의 폭이 더 크고 격렬하다.
- 개량가야금
- 현대에 이르러 새로이 창작되는 다양한 음악들을 연주하기 위해 줄의 수를 늘리거나 소재를 변화시키고, 혹은 공명통의 크기를 달리하여 음정의 폭을 넓히고 음량을 크게 한 악기들이 제작되었다. 줄의 수를 늘린 것으로는 15현, 17현, 18현, 21현, 22현, 25현 가야금이 있으며, 줄의 소재를 달리한 것으로는 철가야금이 있다. 25현 가야금도 합성 소재의 줄을 사용하여 기존의 가야금보다 밝은 음색을 만들어낸다. 가. 연주법 기존의 가야금처럼 왼손으로 뜯고, 오른손으로는 농현을 한다. 양손으로 줄을 뜯어 화음을 만들어낸다.
- 연계정보
- -가야금산조(부산)
-대금정악(大琴正樂)
-1교시 전통음악의 선율구조
-2교시 전통음악의 장단구조
-3교시 전통음악의 두 흐름, 정악과 민속악
-5교시 전통음악 감상 - 관련멀티미디어(전체40건)
-
이미지 40건
해당 이미지는 예술지식백과 저작권 문제로 인해 이미지 확대보기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