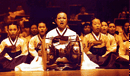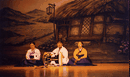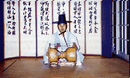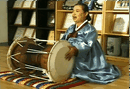예술지식백과
문화 관련 예술지식백과를 공유합니다
경기소리(경기도)
- 작품/자료명
- 경기소리(경기도)
- 지정여부
-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1호
- 구분
- 민속악
- 개요
- '경기소리'는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민간에서 주로 불려진 모든 성악곡을 일컫는다. 직업적인 소리꾼들에 의해 불려졌고 민요와 선소리앉은 소리인 잡가를 모두 포함한다. 민요에는 최근에 이루어진 속요(俗謠)와 선소리무가(巫歌)에서 온 곡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개 맑고 깨끗하고 경쾌하며 분명한 창법을 지니고 있다. 선율은 부드럽고 유창하며 서정적이다. 장단은 주로 세마치나 굿거리가 사용되고 있으며 빠른 한배로 부른다. 음조직은 서양음악의 계명창법에 의하면 대개 솔, 라, 도, 레, 미의 5음으로 된 평조로 되어 있으나 마지막의 ‘미’음은 ‘파’음과 혼동될 정도로 음이 조금 높다. 선율에는 장단3도의 진행이 많고, 위의 5음이 두루 쓰인다. 이와 같은 선법은 흔히 ‘경조(京調)’ 혹은 ‘경제(京制)’, ‘경토리’라고 부른다. 경기소리의 앉은 소리는 속가의 한 갈래인 잡가(雜歌)를 말한다. 잡가의 종류에 <휘몰이잡가>와 <긴잡가>가 있다.
- 내용
- <휘몰이잡가>는 ‘휘몰아치듯이’ 급하게 소리를 몰고 간다는 의미로 <긴잡가>에 비해 가락과 정서의 변화가 급격한 빠른 잡가를 이르는 말이다. 가사 또한 당시 서민들의 변화하는 생활 풍속을 진솔하게 옮겨다 놓았다. 천연두로 얼굴이 몹시 얽은 사람을 그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 물건에 비유한 <곰보타령>이나 갑오동란 이후 개화기 신식 군대에 입대하는 병정의 모습을 그린 <병정타령>, 교태한 여인이 남산을 거닐다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 기생을 보고 자신도 기생이 되기를 청하는 <기생타령> 등은 당시 우리 민중의 삶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휘몰이잡가>는 조선조말 변화하는 세태와 민중들의 의식을 노래한 사설시조에서 연유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판소리나 민요에 비해 선율의 굴곡이나 어조의 변화는 적으나 소리가 맑고 청아하며 차분히 깔리면서 내는 고음색은 해학적인 가사와 어우러지며 독특한 음색을 만들어낸다. 감정의 진폭이 큰 <휘몰이잡가>는 과장된 표현과 허풍이 많다. 선소리꾼들이 제일 마지막에 부르던 곡으로 재미있는 노랫말을 대화체의 빠른 한배로 부르며 대개 볶는타령장단으로 되어 있다. 시조의 변형으로 사설시조에 넣기도 한다. 현재 불려지고 있는 곡은 <곰보타령>, <생매잡아>, <한잔부어라>, <맹꽁이타령> 등이 있다. <맹꽁이타령> 그 중 처녀 맹꽁이 중에 한 맹꽁이 시집을 갔더니 시집 간지 삼일 만에 씨앗을 보아 서방한테 방망이로 얻어맞고 살림살이 판을 치고 반짇고리 뒤집어 업고 실 한 바람 끊어 꽁무니에 차고 고초 나무로 목매달러 가는 맹꽁이를 그 중에 홀아비 맹꽁이가 뒤를 따라오며 하는 말이 네 지금 청춘이라 내가 홀아비니 죽지말고 나고 살자 하고 손목을 잡아 당기는 맹꽁이 다섯(이하 생략)
- 전승자 정보
- 이성희(1942.7.23)는 1962년 당시 종로의 ‘고전성악연구소’에서 국악의 대부인 이창배 옹(翁)으로부터 <휘몰이잡가> 전타령을 사사받았다. 민요에 비해 까다로운 잡가의 목 다듬기는 떠는 목과 감고, 비비고, 조르는 다양한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데 이성희는 오랜 수련을 거쳐 <경기소리 휘몰이잡가>의 기능보유자로 인정되었다.
- 개요
- ‘경기소리’는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민간에서 주로 불려진 모든 성악곡을 일컫는다. 직업적인 소리꾼들에 의해 불려졌고 민요와 선소리앉은 소리인 잡가를 모두 포함한다. 민요에는 최근에 이루어진 속요(俗謠)와 선소리무가(巫歌)에서 온 곡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개 맑고 깨끗하고 경쾌하며 분명한 창법을 지니고 있다. 선율은 부드럽고 유창하며 서정적이다. 장단은 주로 세마치나 굿거리가 사용되고 있으며 빠른 한배로 부른다. 음조직은 서양음악의 계명 창법에 의하면 대개 솔, 라, 도, 레, 미의 5음으로 된 평조로 되어 있으나 마지막의 ‘미’음은 ‘파’음과 혼동될 정도로 음이 조금 높다. 선율에는 장단 3도의 진행이 많고, 위의 5음이 두루 쓰인다. 이와 같은 선법은 흔히 ‘경조(京調)’ 혹은 ‘경제(京制)’, ‘경토리’라고 부른다. 경기소리의 앉은 소리는 속가의 한 갈래인 잡가(雜歌)를 말한다. 잡가의 종류에 <휘몰이잡가>와 <긴잡가>가 있다.
- 내용
- <긴잡가>는 ‘12잡가’라고도 한다. ‘12가사’라는 정가(正歌) 분야의 영향을 받아 지금의 서울 청파동과 만리동 일대의 사계축(四契軸)의 소리꾼들이 ‘12잡가’의 틀을 짰다고 할 수 있다. ‘12잡가’는 <유산가>, <적벽가>, <제비가>, <소춘향가>, <선유가>, <집장가>, <형장가>, <평양가>, <십장가>, <달거리>, <출인가>, <방물가>를 일컫는다. <긴잡가>의 특징은 민요와 시조, 가사의 가락과 운문체 가사들이 혼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잡가의 출생과 향유 지역이 한양이라는 특색에서 연유한다. <형장가>, <소춘향가>, <적벽가>처럼 판소리의 극적인 장면을 한 대목 잘라 노래한 것이나, <유산가>, <제비가>, <선유가>처럼 서정적인 풍경을 읊은 노래에서 서민적인 풍모를 찾아볼 수 있다. 음악 형식은 불분명한 유절형식(有節形式)으로 되어 있고 대개 도드리장단으로 되어 있다. 선법은 서도민요의 선법과 비슷한 것이 대부분이고 경기민요의 경조선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음악의 형태는 12가사와 비슷하며 노랫말은 서민들의 언어로 희로애락을 직접 표현하고 있어 12가사의 점잖은 내용과는 다르다. 창법은 굵고 힘찬 폭넓은 요성을 쓰고 있다. <제비가>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복희씨(伏羲氏) 맺힌 그물은 두루쳐 메고서 나간다 망탕산(芒宕山)으로 나간다. 우이여-어허어 어이고 저 제비 네 어디로 달아나노(이하 생략)
- 전승자 정보
- 임정자(1943.8.23)
- 이미지
- 연계정보
- · 관련도서 <경기문화를 빚는 사람들-경기도무형문화재 총람>, 경기도문화정책과, ㈜경기출판사, 2001· 관련가치정보
- 용어해설
- 사계축(四契軸) : 현재 서울의 서울역 앞에서 뒤로 만리동 고개의 위를 멀리 돌아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 청파동인 청패(靑牌)까지를 이루는 둥그런 일대가 ‘사계축’이라 불리는 특수 지역으로 이곳에 소리를 직업으로 하여 돈을 벌던 사람이 모여 살았는데 이들의 소리가 잡가였다고 한다.
- 연계정보
- -잡가
-민요 - 관련멀티미디어(전체6건)
-
이미지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