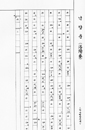예술지식백과
문화 관련 예술지식백과를 공유합니다
낙양춘(洛陽春)
- 개요
- 고려 당악은 송나라의 교방악(敎坊樂)과 사악(詞樂)으로 대표된다. 송의 사악인 <낙양춘>은 고려 때 송나라에서 들어왔으며 <고려사> 악지에 가사가 기록되어 있다. 조선 전기 당악기의 대부분이 고려의 당악기를 전승한 것이기 때문에 당악곡도 역시 고려의당악곡을 계승하였을 것이라 볼 수 있다. <경국대전> 권3의 예전 기록에는 장악원 소속 악공 중에서 당악연주자들을 뽑기 위한 시험곡목들이 나열되어 있다. 시험곡목으로 기록된 당악 곡들은 조선 전기 성종 때 장악원의 악공들이 연주하였던 악곡들인데, 그 중에 <낙양춘>도 포함되어 있다. <고려사> 악지 43곡의 당악곡 중에 8곡만이 성종 때의 경국대전에 나타난다. 이처럼 조선시대에 이르러 송의 사악인 당악곡의 감소라는 역사적 사실은 당악이 조선왕조에 이르러 내리막길을 걸었음을 보여준다. 조선 전기에 연주되었던 당악곡들은 조선후기에 이르러 <낙양춘>과 <보허자>만이 연주되는 변천과정을 밟게 된다. 조선전기 당악의 악공취재에서 시험곡으로 쓰인 <낙양춘>은 성악곡이었는지 기악곡이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속악원보>에 한문가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낙양춘>은 늦어도 18세기 말기의 정조 즈음에 기악곡화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송의 사악은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연주되었으나, 조선 후기부터 차츰 연주되지 않고, <낙양춘>도 사설을 잃은 채 현재 관악곡으로 연주되는 변천을 겪으며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다. 이처럼 <낙양춘>은 오랫동안 가사가 없는 기악곡으로 전해오다가 1960년 이혜구(李惠求)의 ‘낙양춘고(洛陽春考)’에서 그 악보에 가사가 붙여진 이후 대규모의 기악반주 합창으로 종종 연주되고 있다. 원래의 악보는 <보허자>와 같이 정간보 8행으로 4행마다 규칙적으로 박을 친다. 이와 같이 규칙적인 음악이 조선 말기에는 불규칙한 박자로 변하였다.
- 내용
- <낙양춘(洛陽春)>은 고려 때 중국 송나라에서 들어온 송의 사악(詞樂)으로 <보허자>와 함께 당악계 음악으로 분류되며, 아명은 <기수영창지곡(基壽永昌之曲)> 또는 <하운봉(夏雲峯)>이라고 한다. 사악은 5언이나 7언의 시처럼 규칙적인 시가 아니라, 한 구가 5자·6자·7자 등 불규칙한 시의 형태를 갖는다. <낙양춘>은 <고려사> 악지에 송나라 사악 43편 중에 가사만 소개되어 있으며, 악보는 영조 때의 <대악후보>와 <속악원보>에 전한다. <보허자>처럼 가사는 미전사와 미후사로 구성되며, 미후사의 첫 구절은 환두, 둘째 구절 이하는 환입으로 노래한다. 구양수(歐陽脩, 1000~1072)가 지은 <낙양춘> 가사는 다음과 같다. 미전사(尾前詞): 사창이 아직 밝지 않았는데 꾀꼬리 소리 울려 오고/ 혜초 피우는 향로에 남은 향줄기 다 타버렸네/ 비단 병풍 깁 방장으로 봄 추위 막았는데/ 간밤 삼경에 비 내렸네. 미후사(尾後詞): 수놓은 발에 한가히 기대 있는데 가벼운 버들솜이 바람에 나부끼니/ 눈살 찌푸리고 마음 갈피 못잡아/ 꽃 꺽어들고 눈물 씻고는 돌아오는 큰 기러기 향해/ 떠나온 곳에서 내 낭군 만나보았소 하고 물어보았네 (紗窓未曉黃鶯語 蕙爐燒殘炷 錦羅幕度春寒 昨夜裏三更雨. 繡簾閑倚吹輕絮 斂眉山無緖 把花拭淚向歸鴻 問來處逢郞否.) <낙양춘>의 음악적 구조를 살펴보면, 시 1구는 8박에 해당되며, 8박은 4박과 4박의 두 단위로 구성된다. 제4박과 제8박에서 박을 쳐서 두 악절임을 표시한다. <낙양춘>의 시 1구는 5자·6자·7자로 불규칙하게 배열되었으며, 모자라는 자수는 길게 끌어서 음악에 맞추어 노래로 불렸다. <낙양춘>의 악기편성은 당피리가 중심이 되며 편종·편경·대금·당적·해금·아쟁·좌고·장고로 편성된다. <낙양춘>의 음계는 당악계 음악으로 황종의 음고는 C음에 가깝다. 현재 <낙양춘>의 주요 음은 황종·태주·고선·중려·임종·남려·응종의 7음계이다. 그러나 고선과 응종은 각각 단 1회만 나타나므로 7음계의 악상보다는 오히려 중려음으로 종지하는 황종·태주·중려·임종·남려 5음계의 평조 느낌을 준다. 첫머리에서 환두까지의 연주 소요시간은 약7분이며, 곡의 속도는 전체적으로 느려서 가사의 내용이 애절한 데 비해 음악은 장중한 편이다. 장단은 좌고·장고의 연주는 있지만 일정한 길이로 반복되는 장단이 아니고 불규칙하다.
- 악보정보
- <대악후보> 1759년(영조35) 학자인 서명응(徐命膺)이 <대악전보(大樂前譜)>와 아울러 집대성한 것이다. 7권 7책으로 필사본이 국립국악원에 전한다. 특히 권3 이하에 시용향악(時用鄕樂)으로서 고려시대의 <동동>·<만전춘>·<쌍화점>·<서경별곡>·<이상곡>·<한림별곡> 등을 수록하여 고려가요 연구에 있어 중요한 문헌이다. <속악원보> 7권 5책의 필사본으로 국립국악원에서 소장하고 있다. 권1∼3은 제악보(祭樂譜), 권4∼5는 여민락(與民樂)의 관보(管譜) ·현보(絃譜), 권6에 <낙양춘>악보가 실려있으며, 현금(絃琴)의 가야금·비파보(琵琶譜), 권7은 방향보(方響譜)·보허자(步虛子) 등이다. 권6과 권7에 수록된 기보법(記譜法)은 권1과는 달라서 옛날 음악의 변천과정을 엿보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 연계정보
- 재구성국악대사전, 장사훈, 세광음악출판사, 1984.전통음악개론, 김해숙·백대웅·최태현 공저, 도서출판 어울림, 1997.최신국악총론, 장사훈, 세광음악출판사, 1995.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91.한민족음악론, 권오성, 학문사, 1999.http://www.ncktpa.go.kr 국립국악원http://www.koreandb.net 디지털한국학http://www.ocp.go.kr 문화재청
- 관련도서
- 국악대사전, 장사훈, 세광음악출판사, 1984. 전통음악개론, 김해숙·백대웅·최태현 공저, 도서출판 어울림, 1997. 최신국악총론, 장사훈, 세광음악출판사, 199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91. 한국음악통사, 송방송, 일조각, 1984. 한민족음악론, 권오성, 학문사, 1999.
- 용어해설
- * 사악(詞樂)송나라의 사 문학인 송사(宋詞)는 문학적 구조상 크게 둘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첫째는 대곡(大曲)이고, 둘째는 산사(散詞)이다. 이러한 산사나 대곡을 몰아서 문학적으로는 송사라 부르고, 음악적으로는 송의 사악(詞樂)이라고 한다. 당악곡명 중에서 대곡에 해당하는 악곡들은 <헌선도>·<수연장>·<오양선>·<포구락>·<연화대>·<석노교곡파>·<만년환만> 등으로 대부분 춤을 수반한다. 송사의 산사는 가무희에 편입되어 노래로 불린 것이 아니라 독립된 가사를 가리키는데, <고려사> 악지에 전하는 41곡의 당악곡이 산사에 해당한다. 이러한 산사는 모두 짧은 악곡에 얹혀서 노래로 불렸으나, 현재 가사만 전하고 산사의 악곡을 담은 악보는 현존하지 않는다. 총 41곡의 산사 중에서 오직 <낙양춘> 만이 <속악원보>에 악보로 기보되어 전하고 있을 뿐이다.* 아명(雅名)기존악곡의 이름 대신에 아명이라는 좋은 뜻을 지닌 새 명칭을 붙이는 습관이 조선 말기 장악원에서 있었는데, 아명을 쓴 이유는 한정된 연주곡목 때문이었다. 한정된 연주곡목 안에서 장악원의 악사들은 궁중잔치의 여러 경우에 알맞게 기존악곡을 연주하면서도 적당히 새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왕실의 잔치 주인공을 기쁘게 해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악곡의 본명 대신에 쓰였던 여러 아명들은 장악원의 전통음악을 이해하는 데 매우 혼란을 가져다주었다. 그 까닭은 많은 아명들이 당악곡명과 당악정재명을 빌어다가 쓴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미환입>의 아명인 <수연장지곡(壽延長之曲)>은 당악정재인 <수연장>에서 차용한 것이며, <평조회상>의 아명인 <취태평지곡(醉太平之曲)>은 당악곡의 <취태평>에서 빌어온 것이다. 현악보허자인 <보허사>의 아명인 <황하청(黃河淸)>도 당악곡의 <황하청>에서 따다 쓴 것이며, <낙양춘>의 현명(絃名)으로 알려진 <하운봉(夏雲峯)>은 당악곡의 <하운봉>에서 빌어다 쓴 것이다. 아명의 실례들은 국악의 연례악을 이해하는데 어렵게 만들었으나, 아명은 일제시대에도 즐겨 사용되었고, 현재도 국립국악원에서 쓰이고 있다.
- 관련사이트
- 풍류마을
- 관련사이트
- 국립국악원
- 관련사이트
- 디지털한국학
- 관련사이트
- 문화재청
- 관련멀티미디어(전체1건)
-
이미지 1건
해당 이미지는 예술지식백과 저작권 문제로 인해 이미지 확대보기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