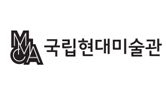예술지식백과
문화 관련 예술지식백과를 공유합니다
처형 1
- 작품명
- 처형 1
- 저자
- 신대철(申大澈)
- 구분
- 1970년대
- 저자
- 신대철(申大澈, 1945~) 1945년 3월 10일 충남 홍성 출생. 공주사대부고와 연세대 국문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서울 신일고, 대신고 교사를 거쳐 현재 국민대 국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96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강설(降雪)의 아침에서 해빙(解氷)의 저녁까지>가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하였다. 시집 <무인도를 위하여>(1977), <나무 위의 동네>(1989) 등을 발간하였다. 황동규의 영향을 다소 받은 것으로 알려진 그의 시는, ‘산’으로 대표되는 자연의 세계에서 갈등 없이 지내던 유년의 화자가, 점차 도시로 표상되는 반자연적이고 인위적인 환경과 만나, 그 대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고민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리뷰
- (……) 비록 발표되지 아니한 작품들이 몇 편 섞이어 있지만, 제작 순서대로 묶이어 있는 신대철의 <무인도를 위하여>를 차례로 읽어가면, 그가 그를 둘러싼 환경과 어떻게 싸우고 성장했는가를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가 제일 먼저 부딪친 환경은, 이 시집의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그를 따라다니고 있는 산이다. 그 산은 그러나 관광객이 들끓는 이름난 산이나, 상상 속의 산이 아니라, 산골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곧 만날 수 있는 친숙한 산이다. 그 산 속에서 자연과 평화롭게 교감한, 자연 속의 나로서, 혹은 내 속을 자연으로서 갈등 없이 교감한 시인의 유년 시절의 점차적으로 도시로서 표상될 수 있는 반자연적인 인위적인 환경에 의하여 침해되기 시작하여, 마침내는 그것의 대립·극복이 시인의 기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무인도를 위하여>의 신대철의 세계라 할 수 있다. (……) 산 속에서의 삶과 하산해서의 삶, 다시 말해 억압 없는 놀이와 억압적인 노동 사이의 대립은 흔히 어머니의 따스한 품과 살기(殺氣)뿐인 생활과의 그것에 비유되는데, 신대철의 시에도 그러한 유추를 가능케 할 시편이 한 편 있어서 주목을 요한다. (……) 비교적 긴 이 시(<처형 1>)에는 시인의 욕망이 교묘하게 은닉되어 있어 자세한 분석을 요한다. 1의 첫 연에서 시인은 산 속에 혼자 남게 된 사람의 쓸쓸함을 친구와 헤어진 사람의 혼자됨에 비유하고 있다. 해, 물, 달, 안개(하루 동안 산에서 볼 수 있는 것의 개략적 총화이다)는 산 속에 그곳을 찾아온 사람을 남겨두고 혼자 간다. 둘째 연에서 그 자연은 ‘아주 집을 뜨신 어머니’와 중첩되어, 어머니와 은연 중에 동일시된다. 어머니 역시 모임과 만남의 집을 떠나신 사람이기 때문이다(간다, 떠난다가 동일시되고 있다). 자연이 어머니와 동일시되는 과정은 그러나 시인의 의식 속에서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그것은 의식의 착오, 착란에 힘입고 있다. ‘혼자서도 모여있지 못한다’, ‘제가 어머니 집이라면 어머니’ 같은 시행은 그 착란의 한 표징이다. 혼자서 모인다는 것은 실제 생활에서는 불가능한 경험이다. 모인다는 여럿을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제가 어머니 집이라면 어머니’에서 뒤의 어머니는 호격이지만, 앞의 어머니는 호격일 수도 있고, 집과 동격일 수도 있다. 호격일 경우 그것은 뒤의 어머니를 강조하기 위한 되풀이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며, 동격일 경우 그것은 나와 어머니의 관계를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 이 의식의 착란 이후에 어머니는 자연- 산과 동일시 되고, 시인은 일상생활에서나, 내면생활에서의 살기를 감추고 산 속에서 산짐승이나 길들이고 싶다고 토로한다. 고전적 정신분석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외디푸스 콤플렉스의 전형적인 예이다. 마침내 나는 어머니 자체와 동일시된다. ‘저를, 어머닐 잡는 덫’. 덫은 그때 자신과 어머니를 시험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셋째 연에서 시인은 잡은 새를 그냥 날려 보내는 나를 보여준다. 어머니와의 합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2의 첫 연에서 나는 그 합일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나를 몇 번 넘겨야 스스로 산 속에 들 수 있나’를 묻는다. 스스로 산 속에 든다는 것은 어머니- 자연 속에 스스로 드는 것 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숲 속에서 떨어져 나온 후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힘이 될 수 있다. 그 합일이 제일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잠- 꿈 속에서이다. 그래서 시인은 ‘모든 사람들의 잠 속으로 흘러 들고 싶다’고까지 말한다. 집단무의식에의 침잠 욕구이다. 둘째 연에서 시인은 ‘식물이 생길 때의 첫소리를 닮은’ 완성된 남자를 희구한다. 동물이 식물로 대치되긴 하였으나, 시인이 노리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의 편안함으로의 회귀이다. 그러나 산- 자연은 그의 괴로움을 끝내 받아주지 않는다. 그는 산 아래에서 살게 ‘처형’되어 있는 것이다. 자연과의 화해, 혹은 어머니와의 화해(그의 전 시편을 통해 어머니가 나오는 것은 위의 <처형 1> 한 편 뿐이다)가 힘들다는 자각은, 다시 말해 시인의 꿈에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은, 그의 시편들에 의해 추측하자면, 군대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인의 군대체험은 그의 평화로운 의식을 일깨워 꿈속의 어둠을 보게 만든다. 시인은 군대생활에 대해서 두 편의 시를 쓰고 있다. 와 <우리들의 땅>이 그것이다. 군대에서 그가 만난 것은 자연을 평화롭게 인지하고, 어머니의 품 속에서 따스하게 살 수 있게 하지 못하는 괴로운 현실이다. (……) ‘꿈과 현실’, 김현, <무인도를 위하여>, 문학과지성사, 1977
- 작가의 말
- 새벽부터 까치가 아카시아 나무 사이를 들락날락한다. 한 마리는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마른 가지를 물어 집터인 나무 꼭대기에 올려 놓고, 다른 한 마리는 꼭대기에 붙어 앉아 얼기설기 집을 짓는다. 이상하다, 이 까치들은 가까이의 다른 많은 나무들을 두고 아카시아 잔가지로만 집을 짓고 있다. 집을 짓기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 나무 밑은 어느새 지푸라기 하나 보이지 않는다. 까치들은 나뭇가지 끝에 아슬아슬하게 앉아 삭정이를 꺾어내고 있다. 그 순간 삭정이를 문 채 허공 속에 뚝 떨어졌다가는 간신히 꼭대기에 날아 앉는다. 하루 종일 같은 일만 계속한다. 5일째, 집은 거의 완성되고 있다. 아침에 얼핏 보이던 까치들은 오후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어디 갔을까? 까치 집이 거의 다 완성되는 날, 아카시아 난무엔 잎이 트고 머지 않아 하늘 저편에선 뭉게구름이 뭉클뭉클 피어 오르리라. 저 까치집에 날아들어 밀리고 밀린 잠을 자고 싶다. 그리고 인간으로 깨어나 다시 인간에서 ‘미래의 말’을 걸고 싶다. ‘자서’, 신대철, <무인도를 위하여>, 문학과지성사, 1977
- 관련도서
- <한국현대문학대사전>, 권영민 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무인도를 위하여>, 신대철, 문학과지성사, 1977
- 관련멀티미디어(전체1건)
-
이미지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