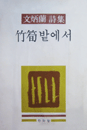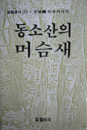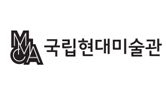예술지식백과
문화 관련 예술지식백과를 공유합니다
직녀에게
- 작품명
- 직녀에게
- 저자
- 문병란(文炳蘭)
- 구분
- 1970년대
- 저자
- 문병란(文炳蘭, 1935~) 전남 화수군(和酬君) 도곡면(道谷面) 원화리(元花里) 출생. 1960년 조선대학(潮鮮大學) 문리대 국문과 졸업. 순천고, 광주제일고교 교사를 거쳐 조선대 국문과 교수를 역임하였다. 1963년 <현대문학(現代文學)>에서 <가로수(街路樹)>, <밤의 호흡(呼吸)>, <꽃밭> 등으로 추천을 끝냈다. 그의 시세계는 생활감정의 승화와 서정을 노래하는 면, 의식의 내면을 탐구하는 면과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는 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추천작품을 비롯한 초기의 시들은 대개 언어예술파적(言語藝術派的)인 입장에서 생활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그의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내면을 탐구하고 의식의 내적(內的) 독백(獨白)을 꾀하는, 일련의 부조리한 현실사회에 도전하여 양심의 소리를 외치는 이른바 참여파(參與派)적인 작품들이다. <조롱(鳥籠)의 새>, <자화상(自畵像)>, <밀항(密港)>, <술을 마신 이튿날>, <패배사초(敗北史抄)>, <나는 병을 앓고 있다> 등이 전자를 대표하고, <완구(玩具)>, <손>, <꽃에게>, <아가의 걸음마>, <기침소리>, <도전(挑戰)>, <사기꾼들>,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 등은 후자를 잘 나타내고 있다. 물론 자기성찰과 현실의식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시 속에 양자는 많이 혼합되어 있다. 호흡이 길고 토운이 강하며, 의식의 독백을 많이 하는 기법도 그의 특징이다. <원탁(圓卓)시(詩)>의 동인이며, 시집 <문병란시집>, <정당성>, <죽순밭에서>, <호롱불의 역사> 등을 발간했다.
- 리뷰
- (……) <직녀에게>는 그의 시편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시다. 또한 남과 북에서 각기 노래로 만들어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애창곡이기도 하다. 모두 26행 단연으로 이루어진 이 시는 월간 <심상>지에 1976년에 발표되었다. (……) 이 작품은 중국을 중심으로 동양권에 널리 퍼져 있는 ‘견우직녀설화’를 시적으로 변용하여 만든 작품이다. 그러나 꼭 이 설화를 알지 못하더라도 이 시를 읽으면 헤어진 연인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애달픈 아픔을 느끼게 된다. (……) 이런 설화적 토대에서 작가는 시를 변용하여 생산해낸다. 우선 지적되어야 할 점은 이 시의 화자가 견우라는 점이다. 이것은 <직녀에게>라는 제목을 보자마자 느껴진다. 그래서 이 시는 남성적인 목울대로 처음부터 웅혼하게 시작되고 있다.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짧은 한숨 같은 이 말은 화자가 얼마나 그리움과 쓸쓸함에 취해 살아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별이 너무 길다”라는 말과 “슬픔이 너무 길다”라는 말을 한 행씩 분리함으로 인해 독자는 아연한 그리움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아직 그리움의 원인을 알 수가 없다. 여기서 시인은 설화를 변용시킨다. 만나려면 오작교를 통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알고 보니 단 하나 있는 까마귀들의 다리마저 끊어져 있는 상황이다. 칠석날 견우와 직녀 두 별의 상봉을 위해 까막까치가 모여 은하에 놓는다는 오작교마저 끊어져 있는 것이다. 도대체 만날 길이 없는 깜깜절벽의 상황이다. 현실은 ‘오작교마저 끊어진’ 불가능의 상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시인은 “지금은 가슴과 가슴으로/ 노둣돌을 놓아”야 한다고 강변한다. 본디 ‘노둣돌’이란 말을 타거나 내릴 때에 발돋움으로 쓰려고 문 앞에 놓은 큰 돌을 말한다. 어떤 새 출발을 의미하는 상징인 것이다. 그러니까 가슴과 가슴으로 노둣돌을 놓는다는 의미는, 새 출발을 향해 ‘맨몸’ 혹은 ‘죽음’으로 노둣돌을 놓는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그래도 그 길은 쉽지만은 않다. “면도날 위라도 딛고 건너가 만나야 할 우리”이고 “선 채로 기다리기엔 세월이 너무” 길기에 적극적으로 찾아 헤매 만나야 할 상대인 것이다. 이후에 시인은 원래의 설화를 펼쳐놓는다. 그대는 나를 기다리며 밤마다 수놓아 짠 베를 다시 풀고 다시 짜기도 한다. 한편 나는 암소를 키우며 그대를 기다리는 풍경이 삽입된다. “내가 먹인 암소는 몇 번이고 새끼를 쳤는데, / 그대 짠 베는 몇 필이나 쌓였는가?”라는 설의법으로 씌어진 아픔은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가. 그리고는 다시 회상된다.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또다시 반복이다. 서두와 중간에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가 두 번 반복되어 그들의 그리움이 되강조되고 있다. 이제는 서두와는 달리 마치 두 행 사이에 긴 은하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 아픔은 눅눅하고 이를 데 없는 그리움 자체다. 지루하게 느껴진다. 반복되어 강조되지만 실상은 휴지부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다. 이토록 단순하기 이를 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힘이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요의 후렴부처럼 쉼인 동시에 힘이 되는 기능이 아닐까? 이런 단순성에 대해 시인은 이렇게 말한다. “특히 전라도적 이미지나 가락에 의존하는 것은 민중의 한의 원천이 바로 이 고장에 있고 민족의 역사적 상황을 상고할 때 그 한의 원형이 이 곳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편협한 지역적 감정과는 관계없이 민중시의 가락을 구하다 보니 내 생태적 욕구에서 저절로 우러나온 것이 아닌가 싶다. (<5월의 연가> 중에서)” 말하자면 그의 단순미는 역사적인 전통, 그러니까 민요적인 집단미학의 표현인 것이다. 이런 단순성은 우리 민중의 보편 정서인 동시에 시인 자신의 정서인 것이다. 이런 단순성을 기조로 현실적인 이미지가 삽입된다. (……) 우리들은 은하수를 건너야 한다 오작교가 없어도 노둣돌이 없어도 가슴을 딛고 건너가 다시 만나야 할 우리, 칼날 위라고 딛고 건너가 만나야 할 우리, 이별은 끝나야 한다 말라붙은 은하수 눈물로 녹이고 가슴과 가슴으로 노둣돌을 놓아 슬픔은 끝나야 한다, 여인아! 여기서는 어떤 설명도 필요 없을 것이다. 앞서 풀어져 있던 이야기의 마치 후렴부처럼 반복법을 통해, 화자의 애절함이 증폭하여 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말라붙은 은하수”를 “눈물로 녹이”자는 설득이 삽입되고 마지막으로 참을 수 없는 기다림으로 “연인아!”라는 호격으로 글을 맺는다. 시를 연 구분 없이 한 호흡 그대로 적어 놓아 그 그리움이 절절 배어나오고 있다. 숨쉴 틈 없이, 절절한 사랑, 철철 넘치는 아픔과 열정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 감동 없는 문학이 넘쳐나는 때일수록 진정성의 울림을 지닌 열매를 맛본다는 기쁨은 얼마나 크나큰 만끽인가. <직녀에게>는 분홍의 아지랑이에 취해 사는 우리의 무딘 일상을 충격적으로 때린다. 부패에 둔화되어 있는 우리의 무딘 정서를 진실이란 힘으로 흔들어 깨우는 것이다. 특히 통일시의 관점에서 볼 때 더욱 감동적인 측면으로 읽힐 수 있다. 찢기고 패인 상처를 진실을 향한 설화의 언어로, 그리움의 언어로 차분히 감싸고 있는 데서 시의 성공이 맺힌 것이다. ‘만남을 향한 설화적 현실의 열망’, 김응교, <문병란 시 연구>, 시와사람사, 2002
- 관련도서
- <한국현대문학대사전>, 권영민 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문병란 시 연구>, 시와사람, 2002 <직녀에게>, 문병란, 시와사회, 1997
- 관련멀티미디어(전체3건)
-
이미지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