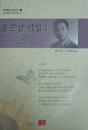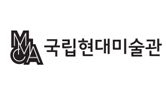예술지식백과
문화 관련 예술지식백과를 공유합니다
나비
- 작품명
- 나비
- 저자
- 윤곤강(尹崑崗)
- 구분
- 1930년대
- 작품소개
- 나비 비바람 험살굳게 거쳐간 추녀밑- 날개 찢긴 늙은 노랑나비가 맨들래미 대가리를 물고 가슴을 앓는다. 찢긴 나래에 맥이 풀려 그리운 꽃밭을 찾아갈수 없는 슬픔에 물고 있는 맨들래미조차 소태맛이다. 자랑스러울손 화려운 춤재주도 한옛날의 꿈쪼각처럼 흐리어, 늙은 舞女처럼 나비는 한숨진다. <윤곤강 전집 1 시>, 윤곤강, 다운샘, 2005
- 윤곤강(尹崑崗, 1911~1950)
- 본명은 붕원. 1911년 9월 22일 충남 서산 출생. 보성고보, 혜화전문을 거쳐 일본 센슈대학(專修大學)을 졸업했다 1934년 카프 제2차 검거에 관련되어 피검되기도 했다. <시학> 동인의 한 사람으로 1934년을 전후하여 시단에 등장하였다. <대지>(1937), <만가>(1938), <동물시집>(1939)이 발간되기까지 초기에는 카프의 한 사람으로 활동했으나, 곧 암흑과 불안, 절망을 노래하는 퇴폐적 시풍을 띠게 되었고 풍자적인 시를 썼다. <빙화>(1940) 이후에는 침묵을 지켰다. 광복 후에는 전통적 정서에 대한 애착과 탐구에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피리>(1948), <살어리>(1948) 등이 그 예이며, <(근고)조선가요찬주>(1947) 등의 저서에서도 그 같은 애착을 찾아볼 수 있다. 이밖에, 평론집 <시와 진실>(1948)이 있다. 1950년 1월 7일 사망했다. 초기에는 일본 시인 하기하라 사쿠타로오와 보들레르의 영향을 받았고, 광복 후에는 한국적·민족적 정서를 추구했다. 그는 어둠을 의식하고 그것을 감정 속에 담아 애절하게 표현한 시를 썼다. 널리 알려진 작품의 하나. 나비를 당시 우리 민족의 참담한 현실에 비유하여 상징화하는데 성공한 작품이다. 어떻게 보면 3연으로 구성된 일종의 시조와도 같은 분위기와 형식을 느끼게 한다. 그만큼 시인의 심상에 부딪친 한 마리 나비의 상황을 질서 있는 이미지로 탁월하게 승화시켜 놓았다고 말할 수 있다. 궂은 비바람에 지쳐 맨드라미 꽃 위에 내려 앉은 한 마리 나비의 슬픈 심정을 둘째 연에서, 셋째 연에서는 화려했던 지난날의 나비와 비참한 현실의 나비를 동시에 클로즈업시켜 나비의 참담한 현실을 더욱 분명하게 형상화했다. 이러한 시인의 내적 이미지의 분명한 질서는 형식면에서도 3행 1연이라는 일정한 질서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당시 우리 민족의 비극적 현실을 섣불리 덤비지 않고, 냉정하리만큼 담담한 심상으로 노래한 작품으로 한 마리의 곤충(昆蟲)을 통하여 현실을 풍자한 독특한 시 중의 하나이다. <한국현대문학대사전>, 권영민 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 윤곤강의 시세계에서 ‘동물’ 이미지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것은 제3시집 <동물시집>의 시편들 전체가 다양한 ‘동물’을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만가>에서 볼 수 있듯 시인이 자신의 정신 영역을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동물’ 이미지를 거치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동물 이미지는 인간의 이성이 개입될 수 없는 어둠의 영역에서 솟아나는 것이며 광기와 무의식, 본능이 혼란스럽게 뒤엉켜 있는 것이다. 그 자체로 카오스적 세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인은 동물의 형상을 모순과 혼돈으로 그려낼 뿐 의식에 의해 질서화시키지 않는다. (……) 30여 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 <동물시집>은 제목이 암시해주듯 모두 동물이나 곤충들의 이미지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그 이미지는 초기 동물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광기와 야수성의 그것이라기보다 인간의 감정과 의식이 투영된 생태적 이미지들이다. 그러한 이미지들은 동물들의 생명현상을 있는 그대로 그린 것이면서 시적 자아의 의식과 겹쳐지는 것이기도 하다. <독사>와 <달팽이>는 <동물시집>의 시편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시인은 ‘독사’나 ‘달팽이’와 같은 동물이나 곤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시인의 의식을 섬세하게 투영시킨다. ‘털벌레가 나비되’고 ‘굼벵이가 매아미되’는 것에 비하면 ‘달팽이의 운명’은 ‘쓸쓸하’고 암담할 뿐이다. 그러나 ‘나비’와 ‘매아미’가 ‘찬서리 내리는 저녁, 이름도 모를 덤풀 속에 송장처럼 쓰러져 슬픔을 씹고 우는 것’에 비하면 ‘달팽이의 신세’가 그리 비관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달팽이>의 메시지다. 이들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는 물론 ‘달팽이’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며 정작 형상화되는 것은 시인의 정서와 의식인 셈이다. 계속하여 이러한 태도로 ‘동물시편’들을 써나가는 가운데 시인은 어디부터가 대상이고 어디까지가 자신의 의식인지 분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달팽이>의 마지막 구절 ‘차라리 이신세가 나는 좋단다’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무엇이 ‘달팽이’의 모습이고 무엇이 ‘나’의 내면인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이다. 대상과 자아 사이를 서로 분간할 수 없는 상태는 <독사>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독사’의 형상, ‘혓바닥’을 ‘낼름거리’는 모습은 <만가> 초기 시편들의 초기 동물 이미지와 유사하다. 그러나 뒤이은 시상의 전개는 예의 <동물시집>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진다. ‘독사’는 자신의 ‘이빨에 물려죽은 <크레오파트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다. 2연의 화자는 ‘독사’이지만 3연의 화자는 시적 자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타자의 이미지가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고 자신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는 시적 기법은 프로이트가 말한 나르시시즘의 욕망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원형적 삶에 대한 집착을 계기로 동물의 본능적 이미지에 침윤되어 있던 시인에게 동물 이미지를 통한 자아의 환영적 동일자 구축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비록 자아의 허구적 이미지 형성 과정에 불과하였지만 <동물시집>을 거치면서 윤곤강은 서서히 타자와 자아 사이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주체 형성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 본고는 전체 윤곤강의 시적 시기 가운데 초기의 <대지>에서부터 중기의 <만가>로 이르는 변모 과정, <만가>의 동물이미지와 <동물시집>의 그것에서 보이는 차이와 변모 과정, 그리고 그들로부터 <빙화>로의 안착(安着)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들 사이엔 어느 한 가지 관점으로 포착될 수 없는 다양한 변화의 계기들이 놓여 있다. 그 모든 것을 묶어낼 수 있는 기본틀이 있다면 그것은 ‘욕망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투쟁에 대한 욕망, 전망에 대한 욕망, 생에 대한 욕망, 자기애에 대한 욕망, 그리고 주체 형성에의 욕망들이 윤곤강의 시편들 밑에서 매우 강렬하게 유동하고 있다. 이러한 욕망들이 다양한 지점으로, 다양한 강도로 떠다니면서 윤곤강의 전체 시세계를 구성하는 동력과 원리가 된다. 이러한 여러 욕망들은 삶을 떠받치는 근원적인 힘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색채를 지녔든 그 자체로 대등하게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계급문학이건 아니건, 그것이 건강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그 욕망이 인간의 진실성에 닿아있는 것이라면 시는 그 모든 욕망의 빛깔을 담아내는 화폭이 될 것이다. 윤곤강은 짧았던 그의 전생애를 통해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시인이다. 그에게 소위 비계급문학은 계급문학과 동등한 지위와 의미를 지닌다. 계급문학이 선택된 것처럼 비계급문학도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계급문학이 절실했던 것처럼 비계급문학도 그에 못지 않게 절실했던 것이다. 윤곤강에게 이들 사이의 구분은 무의미하며 다만 어떤 욕망이 어떤 시를 만들어냈는가가 중요할 것이다. - ‘윤곤강 시의 욕망의 지형도’, 송기한, <윤곤강 전집 1-시>, 윤곤강, 다운샘, 2005 시에 있어서의 대상은 우선 가청적인 ‘언어’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언어란 ‘문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음성’ 혹은 ‘성조’를 가리키는 말이다. 즉 ‘음성’을 가진 언어를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음’의 감각만으로 된 음악과도 다른 ‘의미’를 가진 것이다. 그러므로 시의 의미란 ‘언어’의 한 개 한 개의 단어의 의미에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적 직관이 시적 형상을 가질 때 전체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시의 ‘의미’는 시적 형상이 시적 직관에 감수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그 ‘의미’는 ‘비논리적’이다. 의미가 비논리적이란 말은 의미가 ‘의미 아닌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비논리적인 의미를 가졌다는 말이다. 비논리적인 의미란 ‘생각하는 의미’가 아니라 ‘느끼는 의미’를 말함이다. 생각하는 의미는 논리성을 요구하나 느끼는 의미는 끝까지 비논리성을 주장하고 요구한다. 1. 꽃이 지면 봄은 간다. 2. 봄은 꽃수레를 타고 온다. 3. 봄은 여름보다 더웁다. (1)은 훌륭히 ‘논리적’이다. 1+1=2라는 수학공식처럼. (2)는 두 말할 것도 없이 ‘비논리적’이다. 1+1=3이라는 수학공식처럼. (3)은 논리도 비논리도 아니요, 다만 ‘부정적’이다. 0+0=2라는 수학처럼. (1)에는 생각하는 의미가 있고, (2)에는 느끼는 의미가 있고, (3)에는 부정에 의하며 무의미한 의미가 있다. 이상 세 가지 중에 시의 세계가 영유하는 것은 (2)의 비논리이다. ‘봄은 꽃수레를 타고 온다’- 이것을 단지 생각하는 의미로 본다면 의미가 불통한다. 그러나 그것을 느끼는 의미로 본다면 훌륭하게 의미가 통한다. 그것은 ‘느끼는 의미’ 즉 논리적 의미가 아닌 의미- 비논리적 의미를 가진 까닭이다. 비논리적 의미의 추구!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 시의 세계와 교섭하려는 것처럼 무모한 노릇은 둘도 없다. 천으로 헤아려지는 시작품도 이것의 이해가 없이 쓰여진 것은 마침내 ‘타산의 돌’이 되고 만다. 그러한 의미에서 시의 가치란 실상 그 ‘비논리의 의미’와 정비례된다고 단언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40년 6월 <조광>) ‘시의 의미’, 윤곤강, <시와 진실>, 한누리미디어, 1996
- 관련도서
- <한국현대문학대사전>, 권영민 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윤곤강전집>, 윤곤강, 다운샘, 2005 <시와 진실>, 윤곤강, 한누리미디어, 1996
- 관련멀티미디어(전체3건)
-
이미지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