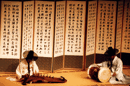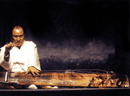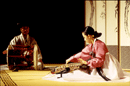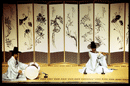예술지식백과
문화 관련 예술지식백과를 공유합니다
산조
- 작품/자료명
- 산조
- 지정여부
- 원광호 외
- 구분
- 민속악
- 개요
- 산조는 전라도를 비롯하여 충청도·경기도 남부의 민속악인들이 주로 연주하던 곡으로, 이 지역에서는 예로부터 이 지역의 무속음악과 관련이 있는 시나위 혹은 심방곡(心房曲, 神房曲)과 그밖에 봉장취 같은 기악합주곡이 연주되었다. 시나위나 봉장취는 일정한 장단틀에 매이지 않은 즉흥성을 띤 가락들의 기악곡인데 이 음악은 느린 데서 빠른 데로 진행되는 장단틀의 정형성, 판소리의 음악 어법을 닮은 선율짜임 등 정교하게 짜여진 가락에 음악의 형식을 갖춘 산조와 비교할 때 매우 단순한 형태이다. 즉 산조 이전 단계의 기악곡으로 봉장취나 시나위를 꼽을 수 있지만 산조의 음악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준 장르는 판소리이다. 판소리를 기악화하려면 판소리의 음악적 특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물론, 연주자의 뛰어난 연주 기량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으로 결국 산조의 초기 연주자는 판소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지역인 시나위권의 전문적인 직업연주자여야 가능했을 것이다.산조는 전남 영암출신인 김창조(金昌祖 1865~1919)에 의해서 연주된 가야금산조가 산조 형태를 갖춘 최초의 산조로 알려져 있으나 한숙구, 심창래, 박팔괘 등도 동시대에 산조의 음악형식을 정형화하는 데 기여한 인물들로 알려져 있다. 김창조 이후 백낙준에 의해서 1896년 처음 거문고산조가 연주되었다고 하며 대금산조는 박종기에 의하여, 아쟁산조는 한일섭, 정철호, 장월중선 등이 동시적으로 만들어 연주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피리산조는 지영희, 이충선 등에 의하여, 해금산조는 지용구, 지영희, 한범수 등에 의하여 연주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도 유동초, 송천근, 한범수의 퉁소산조가 있고 전용선의 단소산조가 있다.
- 내용
- 산조는 남도계면조 음악에 바탕을 둔 시나위와 판소리의 선율적 특성을 각 악기의 특성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연주한다. 산조에 쓰이는 조는 우조·평조·계면조·경드름·강산제·설렁제 등이 있다. 장단은 느린 진양조에서 빠른 단모리까지 쉬지 않고 계속하는데 각 장단형의 처음 한두 장단은 복잡한 선율보다는 기본장단을 알려주기 때문에 악장변화의 구별이 쉽다. 진양조와 중모리 같은 느린 부분의 농현에서 보는 미분음의 효과와 자진모리나 휘모리 부분의 신코페이션(syncopation)과 헤미올라(hemiola)의 복잡한 리듬이 들을만한 대목이다. 휘모리나 단모리같은 부분에서는 빠른 가락을 연주하기 위하여 고도의 기교가 요구된다. 전체적으로 죄었다 풀었다 하는 긴장과 이완의 대비의 멋이 산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산조에 쓰이는 장단은 주로 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이지만 산조의 종류나 바디에 따라 엇모리·굿거리·휘모리·단모리 등의 장단이 삽입되기도 한다.
- 가야금산조
- 가야금산조는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기악독주곡이다. 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엇모리·굿거리·늦은자진모리·자진모리·휘모리·단모리(세산조시) 등의 장단 중 산조에 따라 3-6개의 장단구성에 의한 악장으로 구분되며, 반드시 장구반주가 따른다. 다른 악기로 연주하는 산조보다 먼저 발생하였고, 또 가장 많이 연주되며 바디(流)도 가장 많이 전해진다. 현재 전해지는 산조류를 살펴보면 강태홍류·김병호류·김종기류·김죽파류·김윤덕류·성금연류·심상건류·최옥산류 등의 8류가 있는데, 심상건류를 제외한 다른 유파는 모두 조현법이 같다.
- 가야금산조의 흐름
- 가야금산조는 19세기말 고종 때 김창조(金昌祖)에 의하여 틀이 짜여졌다고 전하나 몇 가지 이설이 있다. 즉, 김창조와 동년배인 한숙구·심창래·박팔괘가 산조를 연주한 것으로 미루어 김창조의 산조를 효시로 볼 수 없다는 설이다. 그러나 산조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시나위(또는 심방곡)와 판소리가 연주되었던 것으로 미루어 틀이 잡히기 전의 유사산조는 김창조 이전 또는 동시대에 있었다고 추측되며, 김창조가 틀을 짜서 오늘날과 같은 산조의 체계를 세웠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김창조 이후 많은 가야금산조의 명인이 탄생하였는데,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가락을 첨가하기도 하고 약간 바꾸기도 하여 보유자의 이름을 붙여 ***제(制), ***류(流)로 전하고 있다. 30분-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가야금산조는 1968년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되었고, 기능보유자는 성금연(成錦鳶)·김윤덕(金允德)이 지정되었으나 해외 이주 및 사망으로 1979년 김죽파(金竹坡)와 김춘지(金春枝)가 보충 지정되었다. 그러나 김춘지의 사망으로 1980년 함동정월(咸洞庭月)이 지정되었다.
- 가야금산조의 조
- 가야금산조의 조는 우조·평조·계면조·경드름·강산제로 이루어진다. 우조의 구성음은 편의상 서양음악의 음명과 구음으로 표시한다면, 동(A)·동(B)·땅(d)·지(e)·찡(g)이며, 동(B)은 반음 위(c)에서 흘러내리는 특징을 가진다. 중심음은 ‘땅’이며, ‘동’은 폭넓은 농현을 하며 ‘동’에서 4도 상행하여 ‘땅’으로 끝나는 종지형이다. 평조의 구성음은 징(c)·땅(d)·지(f)·찡(g)·칭(a)이며, 지(e)를 눌러서 얻어지는 지(f)음이 우조나 계면조에서보다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종지음 ‘찡’의 가벼운 농현 후 계면조로 이어지며 담백한 느낌을 준다. 계면조는 산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조이다. 순수계면조와 평조적인 계면조, 우조적인 계면조 또는 진계면·단계면·평계면 등으로 나뉜다. 순수계면조인 진계면의 구성음은 당(G)·징(c)·땅(d)이나, ‘땅’은 항상 반음 또는 한음 위에서 꺾어내리거나 반음 또는 한음 위에서 폭넓고 격렬한 농현 후 ‘땅’으로 내려오는 등 유동적인 음이다. 중심음은 ‘징’이며, 폭넓은 농현을 하는 ‘당’이 4도 상행하여 ‘징’으로 끝나는 종지형이다. 경조의 구성음은 당(G)·동(A)·징(c)·땅(d)·지(e)이다. ‘징’이 ‘당’으로 하행할 때는 반드시 ‘동’을 경과하는 진행과 여음으로 2도 이상 상행하는 진행이 특징이며 종지음은 ‘징’이다. 강산제의 구성음은 당(G)·동(A)·징(c)·땅(d)·지(e) 또는 지(f)이며 종지음은 ‘징’이다. 평조와 경조와 같은 성격의 조로서 뚜렷한 조의 성격을 나타내기보다는 가락의 특징을 표현하는 용어로 쓰일 때가 많다.
-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 강태홍이 김창조로부터 사사받아 자신이 가락을 첨가하여 이루었다. 장단은 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휘모리로 구성되었던 것이 1950년 이후 세산조시(일명 단모리)가 첨가되었다. 장단별 조의 구성을 보면 진양조는 우조·돌장·평조·계면조, 중모리는 경드름·평조·계면조·강산제, 중중모리는 강산제·평조, 자진모리는 강산제·우조·계면조, 휘모리는 계면조·강산제, 세산조시는 계면조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우조가락에서 구성음 중 편의상 서양음악의 음명으로 표시한다면, 지(e)를 지(f)로 내는 점과 계면조에서는 꺾는 음 땅(d)을 높게 눌러 한음 또는 한음 반을 높게 내는 점 등으로 인해 다른 산조에 비하여 경쾌한 느낌을 준다. 가락이 복잡하고 불규칙적이며 엇박이 많이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다. 1979년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받았고, 예능보유자로 김춘지가 지정되었다.
-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 김병호가 김창조로부터 사사받아 자기의 가락을 첨가하여 이루었다. 장단은 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엇모리·자진모리·휘모리·단모리로 이루어졌다. 장단별 조의 구성을 보면, 진양조는 우조·평조·계면조, 중모리는 계면조·경드름·강산제, 중중모리는 강산제, 엇모리는 계면조, 자진모리는 강산제·계면조, 휘모리는 계면조, 단모리는 계면조로 구성되어 있다. 3도 이상 눌러서 음을 내어주는 폭넓고 깊은 농현을 요하는 가락이 많아 농현으로 정확한 음을 내기 어려운 산조이다. 다른 유(流)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엇모리는 김병호가 1965년경 새로 짜넣은 가락이다.
- 김윤덕류 가야금산조
- 김창조-안기옥-정남희-김윤덕으로 전해져 이루어진 산조이다. 장단은 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휘모리·단모리로 이루어졌다. 장단별 조의 구성을 보면 진양조는 우조·평조·계면조, 중모리는 계면조·경드름, 중중모리는 계면조·평조, 자진모리는 강산제·평조·계면조, 휘모리는 계면조, 단모리는 계면조로 구성되어 있다. 중중모리와 자진모리에서는 헤미올라·신코페이션 등 장구장단과 엇갈리어 떨어지는 가락이 3배나 되는 복잡한 리듬으로 이루어졌다. 담백한 농현의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1968년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되었고 예능보유자로 김윤덕이 지정되었으나, 김윤덕의 사망으로 현재는 이영희와 원한기에게 전수되고 있다.
- 김종기류 가야금산조
- 김종기가 박한용으로부터 전수받아 자신의 가락으로 만들었다. 장단은 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휘모리로 구성되었으며, 장단별 조의 구성을 보면 진양조는 우조·평조·계면조, 중모리는 계면조, 중중모리는 계면조·경드름, 자진모리는 계면조, 휘모리는 계면조로 이루어졌다. 다른 유에 비하여 중모리의 장단이 복잡하다. 곡 전체가 대부분 계면조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며 서편제에 속하는 산조이다.
-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 김죽파가 7세부터 할아버지 김창조로부터 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9세 때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할아버지의 제자인 한성기에게 사사받아 본래의 김창조가락에 자신의 가락을 짜넣어 이루었다. 연주시간 50여분이 소요되는 이 산조는 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휘모리·세산조시로 장단이 구성되어 있다. 장단별 조의 구성을 보면 진양조는 우조·돌장·평조·계면조, 중모리는 경드름·강산제·우조·계면조, 중중모리는 강산제, 자진모리는 계면조·우조·강산제·계면조, 휘모리는 계면조, 세산조시는 계면조·변청강산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채롭게 짜여진 조의 변화, 섬세하고 심오한 농현, 그리고 세산조시에서 계면조로 일관된 다른 유와는 달리 변청강산제로 마무리짓는 점 등이 특징이라 하겠다. 1979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되었고 예능보유자로는 김죽파가 지정되었다.
- 성금연류 가야금산조
- 성금연이 안기옥과 박상근으로부터 사사받은 뒤 자신의 가락으로 만들었다. 본래는 연주시간이 약 30여분의 짧은 산조였으나, 1974년 이후 많은 가락을 삽입하여 1시간 정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연주되는 가야금산조 중 가장 긴 산조이다. 장단은 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굿거리·자진모리·휘모리·엇모리로 이루어져 있다. 장단별 조의 구성을 보면 진양조는 우조·평조·계면조, 중모리는 계면조·경드름·평조, 중중모리는 계면조·평조, 굿거리는 계면조, 자진모리는 계면조·경드름·우조, 휘모리는 계면조·경드름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른 산조에 비해 굿거리의 장단이 삽입된 점, 마지막을 4장단의 엇모리로 마무리짓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한 장단 내에서도 조가 바뀌는 등 조의 변화가 다채롭고, 계면조 또는 경드름에서도 청을 바꾸어 새로운 맛을 내는 선율이 많으며, 농현과 장식음이 많아 기교가 특별히 요구되는 산조이다. 1968년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되었고, 성금연이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으나 1974년 하와이이민으로 인한 국적변동으로 지금은 해제되었다.
- 심상건류 가야금산조
- 심상건이 그의 아버지 심창래로부터 전수받아 이루었다. 장단은 진양조·중모리·자진모리로 현재 연주되는 산조 중 가장 적은 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단별 조의 구성을 보면 진양조는 평조·계면조, 중모리는 계면조·경드름, 자진모리는 계면조·평조로 이루어졌다. 충청도출생인 심상건은 충청도의 독특한 가락을 자신의 가락에 도입해 전라도출생이 연주하는 대부분의 산조와 다른 맛을 낸다. 곡 전체를 통해 우조가 없는 점과 조현도 첫째줄을 다른 유에 비해 4도 낮은 음으로 시작하여 높은 음도 2도 낮게 조율하므로, 곡 전체가 낮은 가락으로 이루어져 심오한 맛을 낸다. 가곡적인 흐름으로 인해 아정한 맛은 있으나 조의 변화가 적어 단조로운 편이다.
- 최옥산류 가야금산조
- 최옥산이 김창조로부터 사사받아 함동정월에서 전수하여 전하여지므로 함동정월류산조라고도 한다. 장단은 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늦은자진모리·자진모리·휘모리로 구성되어 있다. 장단별 조의 구성을 보면 진양조는 우조·봉황조·계면조·생삼청, 중모리는 우조·계면조·경드름, 중중모리는 우조, 늦은자진모리는 우조·계면조·변조(변음), 자진모리는 계면조, 휘모리는 계면조로 이루어졌다. 진양조 가운데 봉황조는 다른 유의 평조와 비슷한 선율이며 계면조도 진계면·단계면·평계면으로 세분한다. 진양조의 마지막 부분 생삼청은 계면조를 3도 위로 이조한 선율로서 이 산조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전조형태이다. 무겁고 절제된 주법으로 농현이 적으며 다른 유에 비하여 전형적인 우조목으로 된 가락이 많아 초기의 가락을 가장 충실하게 보존한 산조이다. 1980년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되었으며 함동정월이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 거문고산조
- 거문고산조는 1896년(고종 33) 백낙준에 의해 처음으로 연주되었으나, 일부층에 의해 거문고의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비난을 받아 빛을 보지 못하다가 개화기에 들어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자유스러운 괘의 이동, 추성이나 퇴성을 이용한 가락의 여음, 자출성의 확대에 따른 음색의 변화, 음역의 확장과 조현법의 변화들은 거문고산조에 나타나는 연주기법들이다. 거문고산조는 수수하면서도 웅장하고 막힘이 없는 남성적인 절제미가 돋보이는 음악으로, 우조와 계면조를 섞은 빠르고 느린 리듬이 조이고 풀고 하면서 희로애락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백낙준이 짠 20분 내외의 거문고산조는 김종기·신쾌동·박석기에게 전수되어 오늘날 신쾌동류·한갑득류·김윤덕류의 세 갈래로 전해진다. 세 유파의 선율짜임새나 틀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다른 악기의 산조와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중중모리와 자진모리 사이에 엇모리장단으로 짜여진 부분이 끼워져 있는 점이다.
- 대금산조
- 대금산조는 대금으로 연주하는 산조이며, 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이다. 대금산조는 정악대금보다 약 2율(律) 높고 길이가 짧은 산조대금 또는 시나위 젓대로 연주한다. 음이 지속되므로 현악기의 산조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음처리와 표현을 할 수 있다. 강렬한 소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깊은 맛을 주는 청울림 소리와 여러 조의 독특한 분위기가 잘 어우러져, 시원한 느낌을 준다. 20세기 초에 박종기에 의하여 처음 만들어졌다고 하며, 그의 가락은 한주환(韓周煥)이 이어받았다. 그 뒤 한범수(韓範洙)가 후진교육을 목적으로 박종기·한주환의 가락 중에서 듣기 좋은 부분만을 선택하여 편곡한 것이 <한범수류대금산조>이다. <한범수류대금산조>의 내용을 보면 진양은 우조·평조·계면조·진계면, 중모리는 우조·평조·계면조, 중중모리는 우조·계면조·평조·계면조, 자진모리는 우조·평조·경조(경드름)·계면조·경조·계면조로 구성된다. 그밖의 명인으로는 편재준(片在俊)·김광식(金光植)·이생강(李生剛)·김동식(金東植)·김동렬(金東烈)·김영동(金永東) 등이 있다. 1971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강백천(姜白川)이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으나 사망하였다.
- 해금산조
- 해금산조는 해금으로 연주하는 산조로써, 현재 한범수(韓範洙)류와 지영희(池暎熙)류가 연주되고 있다. 한범수류는 1964년경 그가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양성소 및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에 강사로 나가면서부터 한 바탕을 만들어 전한 것이다. 다른 악기의 산조와 비슷하게 한범수류 해금산조도 진양·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깊은 맛을 지닌 산조로 알려져 있다. 조운조(趙運朝)·강사준(姜思俊) 등이 그 가락을 이어 받고 있으며, 연주 소요시간은 약 40분이다. 지용구(池龍九)의 시나위 더늠을 일부 전해받은 지영희류는 경기도도살풀이풍(風)의 가락이 많은 산조로, 진양·중모리·중중모리·굿거리·자진모리로 짜여 있다. 진양은 우조·평조·계면조로 되어 있고, 중모리는 계면조·드렁조·계면조로 되어 있고, 중모리는 계면조·드렁조·계면조로, 중중모리는 살풀이조·비청·살풀이조로, 굿거리는 계면조·비청·평드렁조·계면조로, 자진모리는 계면조로 구성되어 있다. 지영희류에는 박상근(朴相根)류 가야금산조와 같이 굿거리장단이 쓰여지는 것이 특징이다. 지영희 해금시나위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2호로 지정된 바 있다. 연주 소요시간은 비교적 짧아 약 20분 정도이고, 김영재·최태현(崔泰鉉) 등이 가락을 이어받고 있다. 해금산조는 본래 지용구로부터 비롯되었으나, 지용구 자신은 경기도도살풀이 장단에 의한 곡이므로 산조라 칭하지 않고 해금 시나위라고 불렀다. 그의 가락을 제대로 이어받은 후계자는 없으나, 단지 지영희가 1935년경에 일부 시나위가락을 사사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 아쟁산조
- 아쟁산조는 아쟁으로 연주하는 산조이며 한일섭(韓一燮)류와 정철호류가 있다. 어느 류이건간에 이 산조는 애절한 감정의 농도가 짙게 표현되고 있어 매우 격정적이다. 다른 악기의 산조에 비해서 청의 바뀜이나 음계의 이동이 제한되어 있는 편이며 우조의 선율 짜임이 극히 적다. 음량이 크고 지속적인 음을 내는 산조 아쟁의 악기적 특성은 감성적이고 표현력이 강한 음악인 산조의 연주에 유리하지만 8현 중 옥타브를 제외한 세줄만으로 여러 음을 장력의 조절로 만들어 연주해야 하는 악기 구조는 음계의 이동이나 청을 변화시키는데 제약을 받는다. 또 활로 문질러서 연주하기 때문에 음색의 변화도 다채로운 편은 아니다. 아쟁산조로 처음 만들어진 한일섭류는 광복 후에 짜여져 비교적 최근에 구성된 산조로 진양·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로 되어 있다. 진양은 우조·계면조로 되어 있고, 중모리 역시 우조·계면조로, 그리고 중중모리와 자진모리는 계면조로 짜여 있다. 한일섭은 새납산조로도 일가를 이루었는데 그의 가락을 박종선·윤윤석 등이 이어받고 있다. 연주 소요시간은 약 25분이다. 정철호류도 진양·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로 구성되어 있고 서용석(徐勇錫) 등이 그 가락을 이어받고 있다. 한일섭·정철호의 가락 이외에 장월중선의 가락을 김일구가 이어받고 있으며 박대성·이귀(李貴)·문일(文一) 등의 여타 산조가락들이 있다.
- 피리산조
- 피리산조는 향피리로 연주하는 산조이다. 산조는 가야금·거문고·대금 등의 악기들이 주로 발전하였고 피리산조는 최근에 연주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악기 자체가 지닌 좁은 음역과 서를 물고 있는 입술의 강도, 입김의 조절이 까다롭기 때문에 장시간 독주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산조를 한바탕 짜서 연주해온 피리연주자가 없다는 점 등이다. 피리산조는 대금산조에서 따온 가락들로 짜여졌지만 산조라기보다는 피리시나위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피리산조 중 가장 늦게 생성된 지영희-박범훈 가락은 근대의 작곡 개념을 산조에 도입하여 창작과 악보에 의한 전승으로 가장 먼저 구전의 한계점을 극복한 산조로 평가받고 있다. 다른 산조와 마찬가지로 장단의 틀과 음계는 전통적인 것을 고수하면서 긴장과 이완의 흐름 속에서 이어지도록 했지만 피리의 독특한 연주법을 적극 활용하여 가락의 시김새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1960년대초 국립국악원에 부설되어 있던 국악사양성소의 강사 이충선은 한주환의 대금 가락을 피리로 옮겨서 지도하였다. 피리로는 원래 시나위를 불었을 뿐이지 진양이나 중모리 등의 산조가락은 연주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충선은 피리의 명인일 뿐만 아니라 대금의 산조도 능하여 대금으로 불던 산조가락들을 피리로도 옮겨 불면서 피리의 특성에 맞도록 가락들을 조정하였다. 이러한 이충선의 피리가락들은 서한범(徐漢範)이 거두어 채보하고 그 위에 다른 악기의 산조가락들을 첨가, 정리하여 한 틀을 짜게 되었다. 이 피리산조는 진양 10장단, 중모리 42장단, 중중모리 37장단, 굿거리 51장단, 자진모리 96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굿거리와 자진모리는 피리 시나위 가락을 옮기고 있다. 피리산조의 멋스러움은 피리 자체의 음량을 최대한 이용한 다이내믹의 효과와 음색의 변화, 미분음 처리, 밀어올림, 흘러내림, 꺾는 소리 등의 표현기교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점과 시원하게 질러내는 대목, 그리고 쭉 뻗어 내리는 선 안에서의 여유있는 출렁거림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1920년대 피리 시나위의 명인 최응래로부터 사사를 받은 지영희는 경기지방(수원)을 중심으로 한 경기시나위를 전하고 있다. 무당의 구음을 피리가 따라 불던 15박의 푸살·살풀이·단오관청·자진모리로 이어지는 그의 시나위는 즉흥으로 연주된다. 산조 중 가야금산조가 제일 먼저 형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악기의 산조에 비해서 유파의 수도 가장 많다. 가야금산조의 시조로 알려진 김창조(金昌祖 1865-1919)가 활약했던 19세기 말기와 20세기 초기에 한숙구(韓淑九 1865-?)와 박창옥(朴昌玉)이 전라도에서 활약했고, 충청도지방에서는 이차수(李且守)와 심창래(沈昌來)가 활약했다고 한다. 김창조는 전라도 영암 출생으로 영암에서 살다가 1917년경에 광주로 옮겨 살았다. 가야금·거문고·양금·젓대·퉁소·해금 등 모든 악기에 능했다 19세 때부터 시나위가락에 판소리가락을 도입하여 민속장단인 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휘모리장단에 짜넣어 산조의 틀을 만들었다고 전한다. 연주시간 15-20분의 김창조가락 가야금산조를 한성기(韓成基)·최옥산(崔玉山)·안기옥(安基玉)·김병호(金炳昊)·한수동(韓壽東)·김종기(金宗基)·정남옥(鄭南玉)·강태홍(姜太弘) 등에게 전수하여 각 연주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가락을 첨가하였으나, 그 틀은 그대로 남아 연주되어 있어 그 맥을 잇고 있다. 김창조와 비슷한 시기에 활약했던 한숙구는 한선달이라고도 불렸다. 전라도 해남출신이며, 신방초(申芳草)와 이장선(李壯善) 등을 사사하여 일가를 이루었으며, 대금과 피리도 잘하였다. 풍류를 주로 하였지만 초기의 가야금산조 형성에 공이 컸고 자신의 산조틀도 만들었다고 전한다. 한수동·한성기·정남옥·안기옥 등에 의하여 그의 가야금기법이, 한주환에 의하여 그의 대금기법이 전해지고 있다. 김창조와 한숙구의 가야금을 전수받은 한성기는 전라남도 강진 출생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의 기능보유자 한농선(韓弄仙)이 그의 딸이다. 16세 때부터 김창조에게서 산조를 배웠으며 전라남도 지방과 서울 등지에서 가야금 연주활동을 하며 제자들에게 전수시켰다. 1930년부터 1941년까지 일본 동경에서 거주하면서 오케이레코드에 가야금산조를 취입하는 등 연주활동을 해왔다. 제자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기능보유자였던 김죽파가 있어 약간의 가락이 전해지고 있다. 김창조의 손녀인 김죽파는 본명이 난초(蘭草)이고 예명은 운선(雲仙)이다. 전라남도 영암 출생이며 8세 때 할아버지로부터 가야금을 시작하였으며, 할아버지가 죽은 뒤 11세부터 13세까지 한성기로부터 산조와 풍류 그리고 가야금병창을 배웠다. 또한, 협률사에 참가하여 전라도를 중심으로 활약하였다. 1926년 16세에 상경하여 여류가야금연주자로 최고의 명성을 떨쳤다. 이때 그는 조선권번에 적을 두고 있었으며, 가야금 이외에도 판소리는 김봉이·임방울·김정문을, 승무는 한성준을, 그리고 병창은 오태석·심상건·박동준을 사사하였다. 1931년 한성준의 반주로 산조 및 병창을 SP판으로 오케레코드사에서 취입, 출반하였다. 1932년 22세에 혼인하였으며 다음해부터 모든 연주활동을 중단하였다. 6·25전쟁이 끝나고 사회가 안정되기 시작한 1955년경부터 일반인들에게 가야금을 가르치면서 음악생활이 다시 시작되었다. 당시 널리 연주되던 산조에 단모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할아버지 김창조와 한성기로부터 배운 산조에 176장단과 무장단의 세산조시를 작곡하여 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휘모리·세산조시의 틀을 완성시켰다. 1956년 김창조계와 다른 산조인 심상건류를 그로부터 배웠고, 1963년 아쟁산조를 한일섭(韓一燮)으로부터 배웠다. 1978년 67세에 무형문화재 제23호 예능보유자로 지정받은 뒤 가야금을 배운 지 60년 만에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처음으로 공개연주를 가졌다. 1979년 할아버지 김창조가락에 진양조7장단·중모리4장단·자진모리4장단·휘모리51장단과 무장단의 일부분, 그리고 세산조시7장단 등 많은 가락을 추가하여 약 55분에 이르는 김죽파산조를 완성시켰다. 1979년 성음사에서 LP판을 출반하였고, 1980년 문화재보호협회에서 <한국전통음악대전집> 제13집을 출반하였다. 1985년 일본 동경에서 2회의 연주를 하였으며, 1988년 일본 킹레코드사에서 가야금산조 콤팩트디스크를 출반하였다. 1989년 일본 대판과 동경에서 연주하였으며, 같은해 뿌리깊은나무사 제작으로 <가야금산조전집>을 출반하였다. 이재숙·김정자·양승희·문재숙 등 많은 연주자들에 의해서 전승되고 있다. 김창조의 가락을 전승받은 또 다른 가야금산조의 명인으로 최옥산을 꼽을 수 있다. 최옥산은 전라남도 장흥에서 출생하였고 1940년경 함경남도 청진으로 이사하였다. 3형제 중 막내여서 ‘최막둥’으로 더 알려졌다. 13세 무렵에 전라남도 영암에 가서 김창조에게 가야금을 배웠다. 체격이 건장하고 얼굴이 넓적하고 검어 소박하고 강직한 인상을 주었으며 성품이 성실하고 원만하였다. 기량이 단단한 명인으로 꼽혔다. 청진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장흥에 은거하며 가야금산조의 연주와 농사로 일관하였다. 그의 문하에서 함동정월·김녹주 등이 나왔다. 그의 가야금산조는 함동정월에 의하여 널리 퍼졌다. 그의 산조는 성음이 분명하고 음악적으로 정연하고 농현이 깊고 간결하며 묵직하고 품위가 있어 예술적 향기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광복 직전까지 청진에서 살았으며 현재 평양 용악산에 묻혀 있다. 가야금산조 및 풍류의 명인으로 알려진 한수동은 대금·시나위·가야금의 명인이던 한숙구의 아들이다. 전라도 해남에서 출생했으며 화순군 동복에서 살았다. 아버지에게서 가야금·풍류 및 산조를 배워 어려서부터 신동으로 이름이 났고 역대 가야금산조 명인 가운데 첫 손에 꼽히고 있다. 천재적인 소질이 있어 모든 악기에 능하였고 자기 나름대로 음악성이 높은 우수한 산조를 개발하였다. 제자에 박경식이 있었으나 전승이 끊기고 말았다. 정남옥도 일제강점기에 활약했던 가야금산조의 명인이다. 정남옥은 전라남도 화순 출생이며 한숙구로부터 가야금산조를 배워 명인이 되었으나 지방에 묻혀 살았기 때문에 그리 알려지지 못하였다. 그의 가야금산조는 서공철·정달용에게 전하였고 현재 정달용이 정남옥의 가야금산조를 이어오고 있다. 정달용이 이어오고 있는 정남옥제가야금산조는 진양·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휘모리로 짜여져 있다. 김종기 역시 정남옥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가야금과 거문고산조의 명인이다. 김종기는 전라북도 장수 출신으로 경상남도 함안·진주 등지에서 살았다. 전라북도 운봉의 박한용으로부터 가야금을 배웠고, 충청남도 강경의 백낙준으로부터 거문고산조를 배웠다. 그는 가야금 및 거문고산조에 뛰어났고, 특히 독특한 가야금산조를 짜서 김삼태·김소희 등 여러 제자에게 가르쳤다. 그밖에도 가야금병창·판소리·해금·북에도 능하였다. 지방에서 악기연주 교육에 전력하는 한편, 때때로 서울에 올라와 조선성악연구회 등 여러 음악단체의 공연에 참가하였다. 가야금산조 및 가야금병창을 취입한 음반이 있다. 그의 가락은 김삼태가 전수받았다. 김병호는 호가 금암이며 전라남도 영암 출생이고 김창조로부터 가야금산조를 전수받았다. 1937년부터 1939년까지 조선창극단원, 1940년부터 1941년까지 임방울창극단의 일원으로 활약하였으며, 부산 봉래권번의 교사로 재직한 적이 있었고, 임춘앵국극단의 악사로도 있었다. 1959년부터 인천여자고등학교에서 전통음악 강사로 재직하다가, 1961년부터 1968년 8월 죽을 때까지 국립국악원에서 연주원 및 가야금 강사로 재직하면서 많은 연주활동과 제자를 길러냈다. 일제강점기 때 취입한 것으로 김창조의 가야금산조에 자기나름대로 가락을 짜넣은 <김병호류가야금산조>가 전해지고 있다. 강태홍도 유파를 이루고 있는 가야금산조의 명인 중의 한명이다. 호는 효산이며 전라남도 무안 출신이다. 원각사에서 창극 활동을 하던 명창 용안의 셋째아들이다. 9세에 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가야금산조의 창시자로 알려진 김창조에게서 전수받았다. 거주지를 대구로 옮기면서 때때로 서울에 올라와서 협률사 조선성악연구회에 참여하여 연주활동을 하고 축음기로 가야금산조 및 가야금병창을 취입하였다. 그때 박차경·최금란 등 제자를 길렀다. 40대 후반에는 부산에서 살며 원옥화·김춘지·구연우·신명숙 등 여러 제자를 길렀는데, 김춘지는 뒤에 가야금산조 및 병창의 예능보유자로 인정받았다. 만년에는 불교에 심취하였고, 제자들에게 의지하여 어렵게 살았다. 그는 음악적으로 심화된 가야금산조를 지어 여러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김윤덕과 박귀희도 배운 일이 있으며, 그의 예술은 제자들에 의하여 널리 전승되어 때때로 가야금독주회에서 연주되기도 한다. 그가 연주한 가야금산조 및 병창은 축음기판으로 남아있다. 가야금산조와 거문고산조의 명인인 김윤덕은 호가 녹야이며 전라북도 정읍출생이다. 1933년 정읍농업학교를 졸업하고 정자선에게 양금정악을 배웠으며, 1934년 김광석에게 가야금정악을, 1935년 김용근에게 거문고정악을 배웠다. 1947년에는 정남희에게 가야금산조를, 1948년에 한갑득에게 거문고산조를 전수받았다. 1945년부터 1950년까지 대한국악원 국극사의 단원이었고, 1950년부터 1961년까지 국립국악원에 출강하면서 많은 제자를 배출시켰다. 1961년부터 1967년까지 서울대학교·숙명여자고등학교·국악예술학교 등에 재직하면서 일본·멕시코·유럽·미국 등지에서 많은 해외공연을 가졌다. 1968년 한국국악협회 이사를 역임하였다. 음악적 재질이 매우 뛰어나 스승의 산조에 새로운 가락을 짜넣어서 <김윤덕류 가야금산조>와 <김윤덕류 거문고산조>를 만들었으며 1968년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의 예능보유자로 인정되었다. 1960년대에 킹스타사에서 거문고산조를 음반에 취입하였고, 1977년 중요무형문화재 기록음반에 가야금산조를 취입하였다. 저서로 <가야금구음정악보>·<현금산조보>·<현금정악보>·<가야금풍류국문신보>·<가야금정악보> 등의 악보가 있다. 김창조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심창래의 아들 심상건도 일제강점의 가야금산조의 명인이다. 심상건은 충청남도 서산 출신이며 가야금 이외에 병창으로도 명성을 떨쳤고 양금과 거문고 풍류 및 해금도 능했다. 흔히 아버지 심창래에게 음악을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인이 말한 바에 의하면 열세 살부터 음악을 하였는데 제대로 배운 것은 양금 풍류 밖에 없고, 그밖에는 모두 스스로 터득하였다고 한다. 특히, 가야금산조의 조율법과 가락은 모두 독자적으로 창안한 것이다. 그의 가야금 조율법은 제1현이 일반적인 조율법보다 완전4도 낮고, 제2현에서 제12현까지는 일반적인 조율법의 제1현에서 제11현까지와 같다. 그는 산조를 연주할 때마다 새로운 가락으로 즉흥연주를 하는 유일한 명인이었는데, 저음역에서 시작하여 차츰 고음역으로 고조되는 형식을 즐겨 사용하고, 평조 및 경조의 우람하고 화평한 가락으로 산조에 일대 변풍을 일으켰다. 1950년대 후반부터는 산조의 본청, 즉 주음을 종전의 ‘징’(제7현)에서 ‘당’(제5현)으로 완전4도 낮게 내려서 연주하였다. 광복 전 일본에서 6회의 레코드 취입을 하였고, 1948년 조택원 무용단과 함께 3년간 미국공연을 하였으며, 1960년 국악진흥회로부터 국악공로상을 받고, 1962년 정부로부터 문화포상을 받았다. 한때 국립국악원 국악사도 지냈다. 거문고산조의 창시자인 백낙준(白樂俊 1876-1930)은 그의 아버지 백선달로부터 구음으로 산조를 전수받아 신쾌동(申快童)·김종기(金宗基)·박석기(朴錫紀) 세 사람에게 전하였다고 한다. 백낙준의 본명은 학준이며 충청도 강경 출신이다. 1896년 20세 되던 해 아버지 선달이 부른 판소리 가락과 시나위 가락을 처음으로 거문고에 옮겨 탄주하였고, 뒤에 독주음악으로 체계를 확립시켰다. 율객으로서 삼남일대를 돌며 거문고산조의 보급에 힘썼다. 백낙준에게 거문고산조를 배운 박석기는 전라남도 옥과 출신이다. 박석기는 일본 동경제국대학을 졸업했으나 예술에 뜻을 두고 거문고산조의 창시자인 백낙준에게서 거문고풍류와 거문고산조를 배워 명인이 되었다. 향리에 초당을 짓고 명인·명창들을 초빙하여 사범으로 삼고 젊은 음악학도들을 모아 전통음악을 교육하여 일제강점기에 인멸되어 가는 전통음악 전승에 기여하였다. 이때 박동실을 판소리사범으로 초빙하여 김소희·한애순·김녹주에게 판소리를 가르치게 하였고, 거문고사범은 스스로 맡았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6호인 거문고산조의 예능보유자였던 한갑득도 그에게서 거문고산조를 배웠다. 박석기의 산조는 한갑득(韓甲得 1919-1987)에게 전승되었다. 한갑득은 전라남도 광주 출신이며 판소리 명창 한승호의 형이다. 13세에 광주에서 안기옥으로부터 3년간 가야금산조를 배웠고, 15세에는 담양에서 박석기로부터 8년간 거문고산조·줄풍류·가곡반주를 배웠다. 23세에 서울에 올라와 조선성악연구회에서 연주활동을 하였으며 1970년 후반부터 국립국악원 악사로 재직하였다. 1978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산조>의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음악적 재질이 뛰어나고 음악성이 높아 스승에게 배운 가락을 토대로 많은 가락을 창조하여 연주하였는데, 연주할 때마다 신묘한 가락이 나와서 주위를 놀라게 하였다. 신쾌동도 거문고산조의 대가이다. 신쾌동의 호는 금헌이고 원명은 신복동이다. 전라북도 익산 출신이며 9세 때에 박생순에게 양금을, 12세 때에는 박학순에게 가야금(정악·산조)을 배웠고, 13세 때에 정일동에게 거문고로 민간풍류를 배웠다. 16세 되던 해에 거문고산조의 창시자인 백낙준 문하에 입문하여 산조를 처음으로 배웠다. 백낙준가락을 이수한 후 고향인 익산에서 고창으로 거처를 옮겨 산조음악에 전념하고 있을 때, 당시의 명창 임방울·이화중선·이중선의 권유로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소재의 줄포가설무대에서 처음으로 거문고산조를 연주하였다. 그 뒤 목포의 목포극장에서 명창 이동백·정정렬·박녹주와 공연하였고, 1933년 5월 10일에 후진양성과 창극운동의 전개를 목적으로 창립된 조선성악연구회에 가입하여 많은 연주활동을 하였다. 그가 활동한 무대는 서울의 부민관·단성사·동양극장·조선극장, 평안북도 평양의 금천대좌, 함경남도의 함흥극장 등이었다. 그의 문하에서 배출된 제자로는 황오익·강성재·김병두·양기평·조위민·김기환·김영제·윤경순·정옥자·구윤국·김무길·성기군·이창홍·이세환·김효순·김영욱 등을 들 수 있다. 거문고산조를 융성하게 한 공이 크며 1967년 7월 16일 중요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산조 예능보유자(1967. 7. 16-1977. 11. 29)로 지정받았다. 거문고산조의 음반이 남아 있다. 대금산조의 창시자는 전라남도 진도 사람인 박종기(朴鍾基 1880-1947)이다. 박종기는 집안 어른들로부터 젓대 시나위를 배운 뒤, 수련을 쌓아 신접한 경지에 이르러, 젓대를 불면 산새가 날아올 정도였다고 한다. 서울에 올라와 당시 민속악의 명인·명창들과 극장공연을 많이 하였다. 1933년 조선성악연구회에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민속음악단체를 따라다니며 창극반주를 하는 등 많은 연주활동을 하였다. 후배 강백천과 친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각각 대금산조를 짰는데, 그는 김창조 가야금산조나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경우와 같이 판소리에 나오는 우조·계면조·설렁제(드렁조) 등 여러 조를 도입하고, 그것을 진양·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 장단에 얹어서 체계를 세워 짰다. 대금산조는 지금까지 음악적으로 보아서 다른 분야의 어떤 산조에 비하여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의 산조는 한주환에게 이어졌으며, 일제강점기에 그의 대금산조를 담은 음반이 지금도 남아 있다. 지방공연 중에 죽어, 그의 소원대로 진도섬 길가 언덕에 묻혀, 오가는 행인들에게 무언의 위로를 주고 있다. 박종기의 후계자는 전라남도 화순 사람인 한주환(韓周煥 1904-1966)이다. 한주환은 그 고장 명인들에게 대금풍류를 배우고, 당시 박종기 문하에 들어가 대금산조를 배웠다. 1933년 조선성악연구회에 참가하여 활약하였고, 1959년 임춘앵창극단에서 악사로 활약하였다. 그는 음질이나 기량이 뛰어나 박종기가 죽은 뒤 최고명인으로 꼽혔다. 그의 제자로 서용석·이생강이 있다. 한주환의 대금산조 음반이 남아있다. 한범수(韓範洙 1911-1984)는 대금산조·해금산조·퉁소산조의 명인이다. 본관은 청주이며 충청남도 서산 출생이다. 10세 전후에 단소를 배웠고, 20세를 전후하여 지방명인들로부터 대금산조를 배우다가 박종기에게 잠깐 배운 바 있다. 박종기와 한주환의 대금가락을 토대로 하여 한범수류의 대금산조를 개척하였다. 1964년 이후 국립국악원의 국악사양성소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강사로 출강하면서 대금산조를 강의하는 한편, 그의 대금산조를 토대로 하여 해금산조를 짜서 해금산조도 강의하였다. 그의 문하에서 많은 대금산조·해금산조의 명인이 나왔다. 1966년에는 국악예술학교 강사로 있었다. 그는 젊어서 유동초로부터 퉁소시나위를 이어받아 퉁소산조도 만들었으나 후계자가 없다. 시나위 더늠의 대금산조는 강백천(姜白川 1898-1982)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강백천은 남원 출생이며 만년에는 부산에서 살았다. 어려서부터 대금시나위를 잘 불었는데, 여러 창극단에서 대금을 불었다. 대금산조를 먼저 짰다는 박종기와 교분이 있었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대금산조를 짰다. 그의 산조는 진양·중모리·중중모리·잦은모리 장단으로 조성되고, 우조와 계면조로 짜되 계면이 주가 되어 대금시나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시나위더늠’이라 부르고 있다. 이것은 박종기 대금산조가 우조·설렁제(드렁조)와 같은 판소리조를 구사하고 선율이 판소리형에 가까운 것과 대조적이다. 1971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 대금산조기능보유자로 인정 받았고, 이수자로 김동표·송부억쇠·이엽 등 3명을 길렀다. 이외에 이생강·서용석은 한주환에게 본격적으로 대금산조를 배워서 자신의 류를 이루고 있다. 또 원장현은 박종기의 대금산조를 잘 알고 한주환의 대금산조에 영향을 주었던 한일섭에게 구음으로 배워 대금산조의 일가를 이루고 있다. 해금산조는 지용구(池龍九 1857-1938)에게서 비롯되었다. 한말과 일제강점기에 활약했던 지용구는 경기도 수원 출신이다. 일찍이 이혜구는 “시나위와 사뇌에 관한 시고”에서 “전에 함(咸)아악사장이 고 지용구옹의 해금을 비평하여 말하기를 그는 해금으로 시나위나 할 줄 알지 정악은 어떻게 한단 말이냐고 일소에 붙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가야금산조로 시작된 산조음악을 바탕으로 하여 해금산조를 풀어낸 뛰어난 기량의 소유자이다. 정악도 익혀 정악전습소의 풍류에도 참여하였고, 조선정악단의 일원으로 줄풍류인 <영산회상> 연주에 참여했으며, 삼현육각인 무용반주를 담당하는 등 정악에도 어느 정도 정통하였다. 해금 이외에 장구에도 일가를 이루었으며, 그의 음악은 지영희에 의하여 전승되었다. <굿거리>와 <해금시나위>의 음반이 전한다. 지용구에게 해금산조를 전수받은 지영희는 피리시나위의 명인이기도 하다. 지영희의 본관은 충주이고 경기도 평택 출신이다. 국내 최초로 가야금산조부문에서 인간문화재로 지정받은 성금연이 그의 아내이다. 1918년에 이석은에게 승무·검무 등 여러 춤을 배웠고, 1928년에 조학윤에게서 호적을 배웠다. 1930년에는 정태신에게 양금·단소·퉁소를 배웠고, 1931년에 지용구에게서 해금·풍류 시나위를 배웠으며, 양경원에게 피리 삼현육각과 시나위를 배웠다. 1932년에는 김계선에게 대금시나위를 배웠고, 1935년에는 지용주에게 무악장단을 배웠으며, 다음해에는 박춘재에게 경기소리·서도소리를 배웠다. 1937년 조선음악연구소에 입소하여 악사가 되었고, 1938년에는 한성준무용단의 반주악사로 활약했으며, 1946년에는 서울중앙방송국 전속국악사가 되었다. 1960년에는 국악예술학교 교사로서 유망한 신인을 많이 길러냈다. 1966년에는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초대상임지휘자로 취임하였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2호 시나위의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가, 1975년 해외이민으로 지정이 해제되었다. 해금산조와 피리 시나위를 통한 피리산조의 길을 열게 한 뛰어난 민속음악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아쟁산조는 해방 후 한일섭(韓一燮 1929-1973)에 의해 처음 연주되기 시작했다. 한일섭은 아쟁뿐만 아니라 호적산조의 명인이기도 하다.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강성리에서 출생한 그는 어려서 매부인 성원목에게 판소리를 배웠으며, 1947년부터 창극단 반주악사로 있었다. 1958년 한때 여성국극단의 악사장으로 있으면서 신작 창극의 작곡·편곡으로도 유명하였다. 1962년에 아쟁산조를 처음 지어냈고, 1968년부터 국악예술학교 교사로 봉직하였다. 한일섭류 아쟁산조는 박종선에게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한일섭류 아쟁산조 이외에 정철호류는 서용석이, 장월중선의 가락은 김일구가 이어받고 있다. 피리산조는 1960년대 초에 이충선(李忠善 1901-1989)에 의해 연주되기 시작했다. 이충선은 경기도 광주 출신이며 23세 때 방용현으로부터 대금삼현 및 시나위를 배웠고, 24세 때 양경원으로부터 피리삼현 및 시나위를 배웠다. 35세 무렵 서울에 올라와 악사로 있으면서 정악악사 이재규로부터 피리줄풍류 전바탕을 배웠고, 36세 때 정악원에서 정악악사 민완식으로부터 양금풍류 전바탕을 배웠다. 1950년대 후반 성금연과 심상건으로부터 가야금산조를 배웠다. 1960년대 초 국립국악원 악사로 근무하며 대금산조와 피리산조를 짰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송파산대놀이> 피리반주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이충선의 가락은 현재 서한범이 이어받고 있다. 이밖에 피리유파로 오진석-정재국 가락, 지영희-박범훈 가락 등이 있다.
- 관련도서
- 전통음악개론, 김해숙·백대웅·최태현 공저, 도서출판 어울림, 1997. 최신국악총론, 장사훈, 세광음악출판사, 199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91. 한국음악통사, 송방송, 일조각, 1984.
- 용어해설
- * 봉장취전라, 충청, 경기 등 남부 지방에서 전승되어 오던 민속 기악곡의 하나. <봉장추>, <봉작취>, <봉황곡> 등으로도 부른다. 음악의 중간에 새소리를 흉내내 제목을 봉장취라 했다. 산조가 생기기 이전에 성행하여 산조가 생긴 뒤 차츰 자취를 감추었다. 즉흥적인 연주가 특징이다.
- 관련사이트
- 풍류마을
- 관련사이트
- 국립국악원
- 관련사이트
- 디지털한국학
- 관련사이트
- 문화재청
- 관련멀티미디어(전체5건)
-
이미지 5건